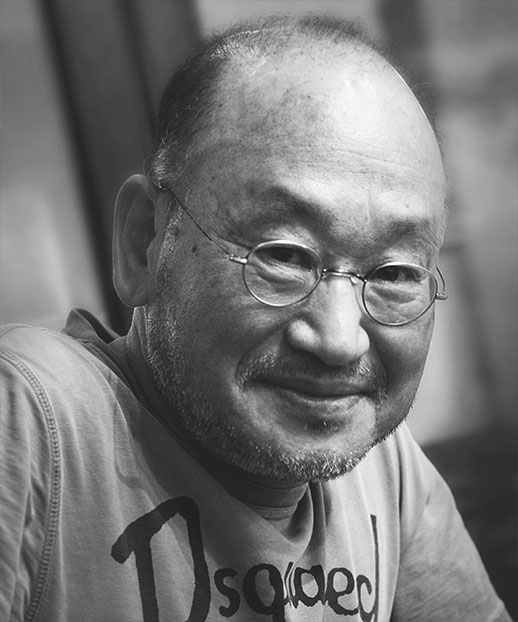개인전 (요약)
이갑철은 《거리의 양키들》(한마당화랑, 서울, 1984), 《도시의 이미지》(한마당화랑, 서울, 1986), 《타인의
땅》(경인미술관, 서울,
1988), 《충돌과 반동》(금호미술관, 서울, 2002), 《에너지, 기(Energy,
氣)》(한미사진미술관, 서울, 2007, 2008) 등의 개인전을 열었다.
그룹전 (요약)
이갑철은 《다큐멘터리 스타일》(고은사진미술관, 부산, 2012), 《Chaotic Harmony: Korean Contemporary Photography》(휴스턴미술관, 텍사스, 미국, 2009), 《2009 오디세이》(예술의 전당, 서울, 2009). 《한국현대사진 60년: 1948~2008》(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08), 《Paris
Photo》(루브르박물관, 파리, 2005) 등 국내외
주요 미술관에서 그룹전에 참여한 바 있다.
수상 (선정)
이갑철은 제2회 한국저축은행 제비꽃 서민사진작가상(2008), 제2회 동강사진상(2003),
일본 사가미하라 아시아 사진가상(2003)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작품소장 (선정)
이갑철의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금호미술관, 한미사진미술관, 동강사진박물관, 산타바바라미술관(캘리포니아) 등에 소장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