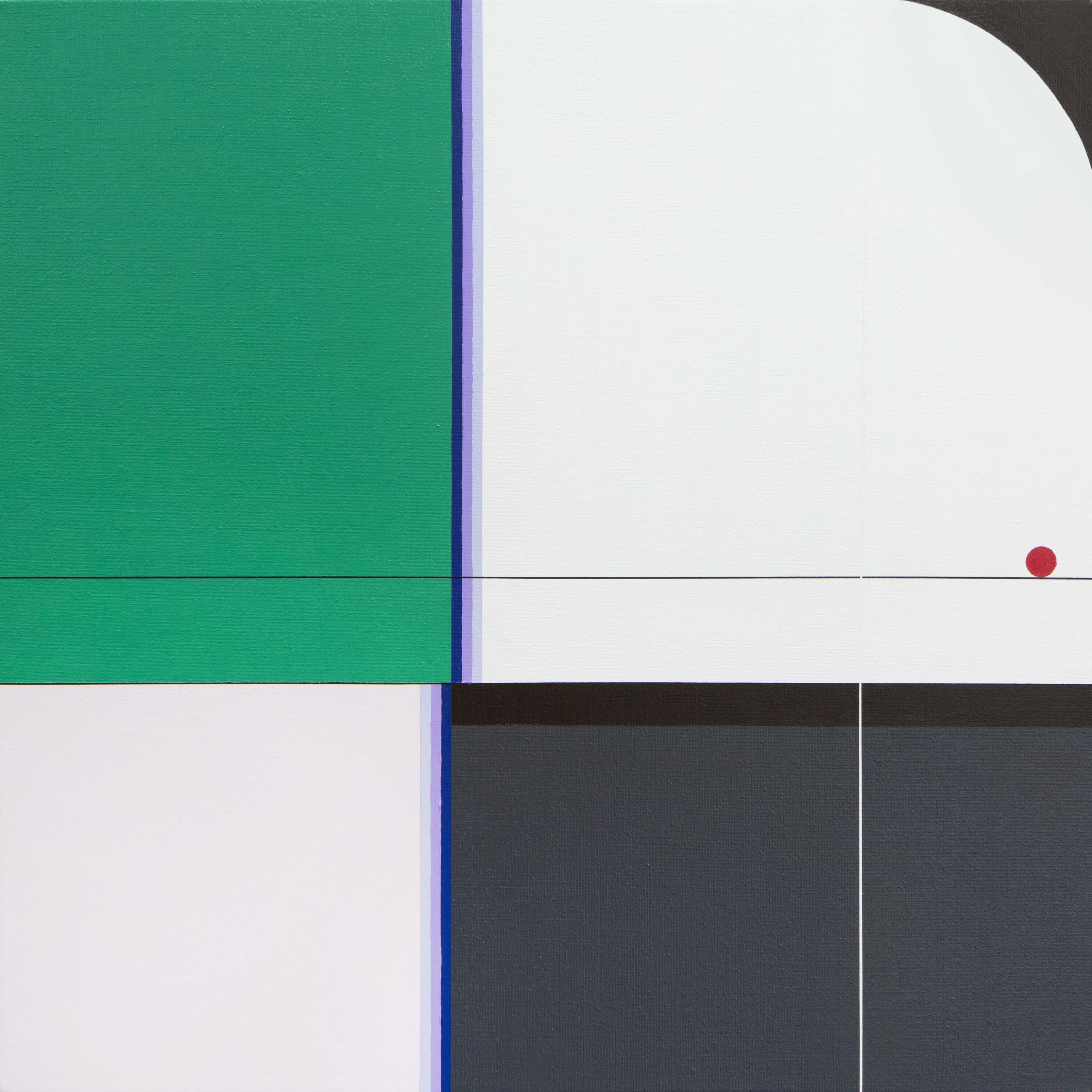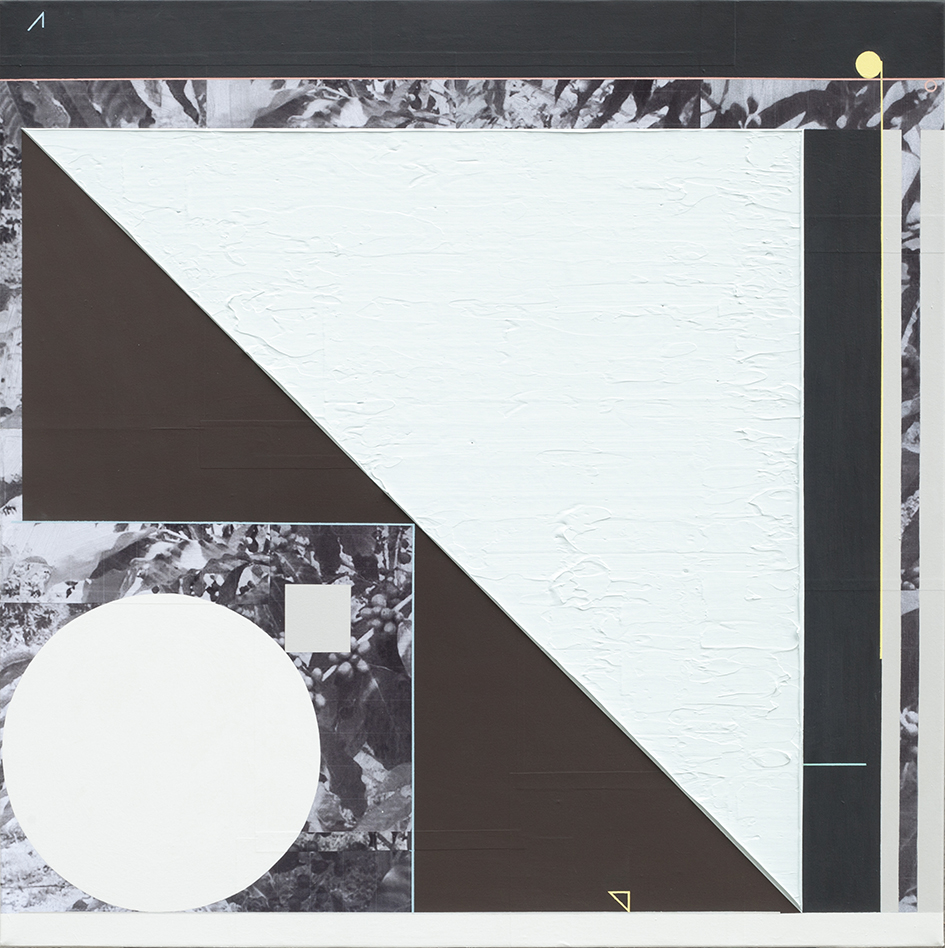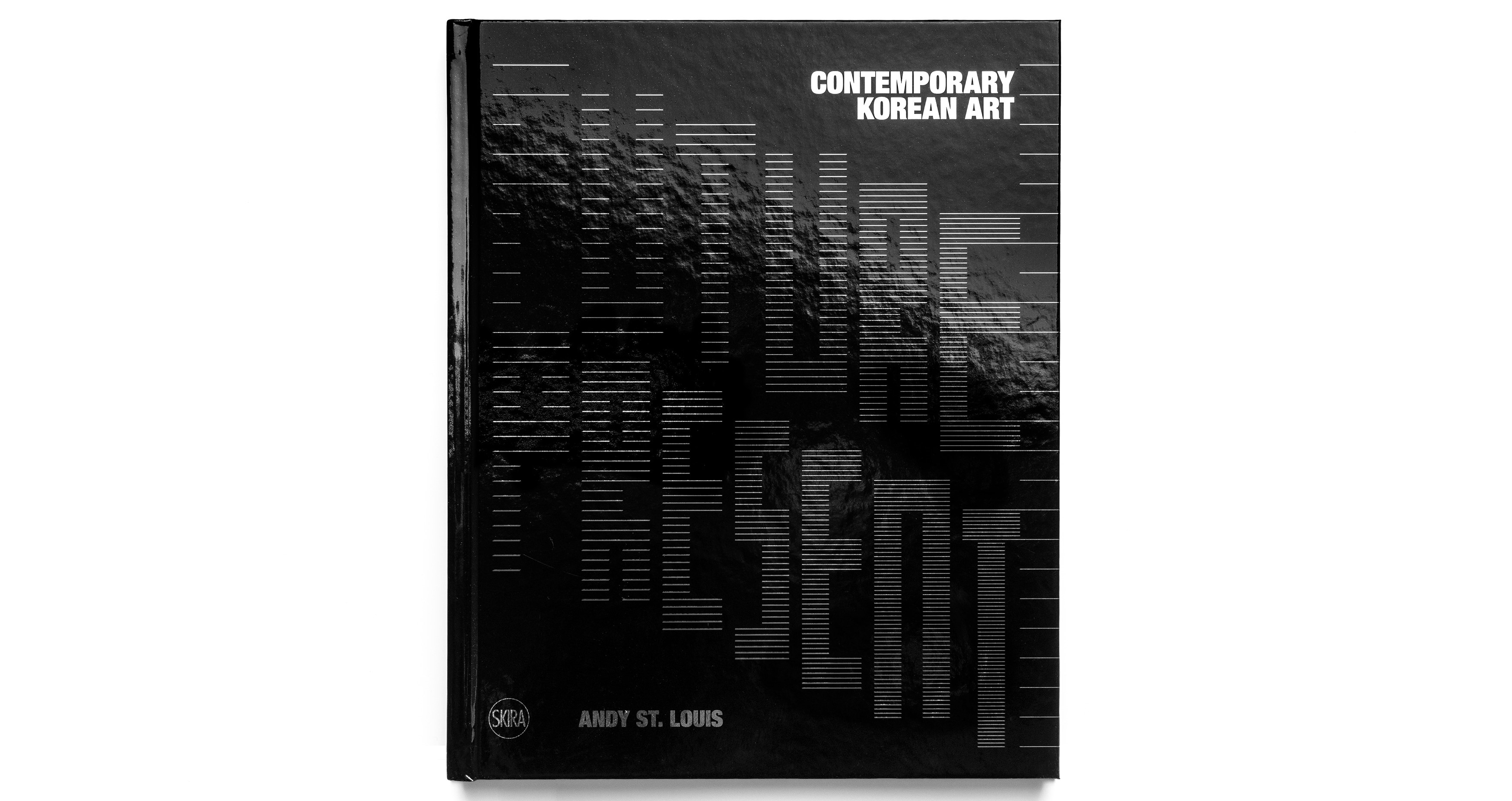그
출발은 구상이었다. 하지만 분명 풍경을 그리는 와중에 그의 시선이 그 풍경의 이면을 향해 있지는 않았다. 어쩌면 풍경은 회화의 장르에서 가장 ‘솔직한’ 회화라고도 할 수 있을 테다. 렌즈를 통해 빛과 피사체를 오롯이
현상하는 사진과 같이, 작자가 바라본 자연 또는 인공의 풍경을 화폭 위에 ‘잘’ 옮겨낸 작업이 바로 이 풍경화일 것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여러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수식어 ‘잘’을 어떻게 풀이할 것인가의 문제다. 문맥상, 이 뜻은 모호하다. 결국 구상이든 추상이든 그 외연의 표상 외에는
곧 무엇을 ‘본다’라는 행위만이 남겨질 뿐이다. 이 ‘본다’는 행위는
그 실행의 주체인 행위자의 주관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이때 바라보아지는 그 ‘대상’에는 ‘보는’ 행위 주체의 내면으로부터 생성된 의식의 여파가 고스란히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대상과 주체 사이의 감각적 전유 과정은 대상을, 또한 그것을 둘러싼 각각의 주체들을 특별한 관계로 엮어낸다. 따라서 동일한 풍경을 담고 있는 회화임에도, 그들 간 사실 중요한
화두는 ‘무엇을’이 아니라
‘누가’일 수 있다. 작업의 범주 안에서 ‘무엇이 누구에 의해 그려지고, 또 보여진다’라는 이 자명한 명제는 그려진 무엇을 두고 창작과 관람의 주체들이 행하는 ‘본다’는 행위, 그리고 이로부터 기동하는 상호작용의 틀이 하나의 미적 기조로서
분명 그 유효함을 방증하는 예시가 되기도 한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이희준의 초창기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Yellow Scene〉 연작은 바로 이상의 논리와 연관이 있어 뵌다. 이 작업들은 구상의 영역에서 창작의 당사자가 어디엔가 멈추어 둔 시각적 프레임에 뒤따르는 감각체들을 옮긴다. 작가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대부분 특정한 건축물이나 그러한 건축물들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다면적인 삶의 흔적들로, 흥미로운 건 작가의 시선-프레임이 담거나 잘라버린 이미지가 그저
풍경의 기술적 재현의 단계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희준의 풍경은 그보다 한층 더 풍경의 바깥, 다시 말해 그것을 감상적 차원이 아니라 풍경을 바라보는 시선을 대상적 이미지로서 포착하려는 시도에 가깝게 다가간다. 작가가 대상을 시선의 화각 테두리 안에 배치하는 구조화된 구도는 대상 자체를 그대로 떠내듯 담아내고자 의도하는
풍경화들과 확실히 다른 감각을 불러일으킨다. 다시 말해 이희준은 그가 바라보는 풍경에 그려냄을 목표로
한 기존의 풍경과는 다른, 선택된 이미지의 지위를 부여하고자 하며 그 도출된 결과가 자신이 찾는 이미지
구성에서의 어떤 공식 증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굳이 숨기지 않는다. 그 때문인지, 당시의 풍경 작업들은 각각의 장면을 단일한 추상의 톤으로 완결하거나, 그
아래 펼쳐진 구체적 피사의 이미지들을 묘사하는 데 있어 점, 선, 면으로
그려진 상징적인 기본 도형의 형태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 역시 당시 작업에서 나타나는 특징적 면모다. 그의
화면은 구체화한 이미지들의 표상으로 점철할지언정, 실제 이러한 표현을 통해 작가가 추구했던 바는 추상의
영역에서 제기 가능한 여러 논의를 위한 단초로서 그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었던 것은 아닐까. 2012년에서 2014년 사이의 〈Playground〉 연작은 프레이밍을 주요한
도구로 활용하는 이희준의 실험이 좀 더 형식적인 차원에서 실행된 경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시기에
작가는 삼각형 형태의 캔버스에 그 외곽의 형태를 마치 창문의 틀과 같이 감내하는 잘린 이미지를 삽입하면서 자신의 구도화 작업을 좀 더 극단적인
형태로 전개했다. 작업은 내용과 형식의 연관성을 단절한다. 이미지
자체의 구성, 그리고 그러한 방법을 통해 드러나는 조각난 이미지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작가는 특정한 감각의
소회를 창출한다. 이처럼 내용과 형식이라는 이중적 차원에서 가리고, 잘라내며, 붙이거나, 드러내기와 같은 미술의 원초적인 기술법을 적극 활용하면서
이희준은 새로운 이미지의 구성을 시도한다. 바로 이 시기의 작업에서부터 어쩌면 그의 구상은 이미 회화라는
범주 안에서 병치될 수 없었던 추상성과의 공존을 상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2015년부터 이와 같은 작가의 접근 방식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난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의 〈Interior nor Exterior: Prototype〉
연작과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제작된 〈The Speakers〉 연작, 그리고 2017년의 〈Emerald Skin〉 연작들은 이후에 등장한 이른바
온전한 추상 단계를 예비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작업들의 순차는 가시적인 형태를 살핀다면
그것을 추상화라고 분류해야 할 만큼 이미지적으로 구상의 흔적이 지워져 있다. 하지만 그는 각 작품의
제목을 통해 이들이 무엇을 원본으로 추상화되었는지를 유추할 수 있게 함으로써, 추상과 구상 사이의 관계를
어떠한 방식으로 정립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그때까지는 유예하고 있었던 것도 같다. 이에 본 작업에서
작가가 구사하는 추상은 온전히 그 형상 자체를 자기 수단이나 의미로 가지는 수준으로는 나아가지 않고, 여전히
다른 무엇을 의지하기 위한 형이상학적 표현의 수단으로 기능했다. 작가가 추상의 표현을 그 자체로 완결하면서도, 이후 그 표현의 방식에 적합한 활용 목적을 부여한 때는 2018년에서 2019년에 걸쳐 그가 그린 〈A Shape of Taste〉나 〈Floating Floor〉 연작들이 등장한 시기와 맞물린다. 이제
이희준에 작업에서 추상은 완벽하게 구상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추상의 형상들을 화면의 전면에 배치하며
작업은 그 각기 다른 형이상학의 상들을 통해 어떠한 구성으로 스스로를 드러낼 것인지에 좀 더 힘쓰는 모양새를 띠었다. 자칫 미술사적 추상이라는 전통적 맥락으로 작품들을 몰아갈 수도 있었던 색면은 도리어 개념이라는 측면을 내려두고
그 장식적 구성의 모색에 집중함으로써, 색면 추상을 이희준 작업 전체의 구성을 이루는 주요한 근거의
지위로 끌어올리는 데 일조한다. 그리고 대략의 시기에 함께 나타난 〈Biei〉에서는
현실에서의 경험을 다시금 추상에 결합하려는 작가의 시도가 다시 한번 동하면서, 당시의 작품으로 구상(성)과 추상(성) 사이의 균형을 제 표현법으로 정제해내고자 했던 이희준의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다. 2020년에 레스빠스 71에서 열린 그의 개인전 《The Tourist》에서 그는 자신이 경험한 공간을 직접 기록한 사진 이미지를 아예 노골적으로 작품 안에서 노출시키는데, 출력한 촬영 사진 프린트 위에 이전의 작업에서 차용한 추상의 색면을 레이어 삼아 올리는 작업의 형태가 바로
그것이다. 이어진 2021년의 〈Image Architect〉 연작에는 이희준 작업을 관통하는 핵심의 과정, 즉
가리거나 드러냄의 의지로 도달하고자 하는 적당한 균형과 이를 위한 이미지 세공의 과정이 점차 방법론화하기 시작했다. 《The Tourist》 전에서는 색면을 통해 이미지를 어떠한 방식으로
가릴 것인가에 초점을 두었다면, 본 작업은 전체적인 캔버스의 스케일을 키우고 그 위에 색면의 자유로운
배치와 동선을 확보하기 위한 물리적 공간과 심상적 여유를 마련하고자 힘쓴다. 이를 통해 작가는 배경
사진 이미지의 색채, 해상도, 구도의 설정을 조율하여 구상
이미지의 추상성을 획득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 추상 색면의 매체적 특징을 강하게 드러냄으로써 짙은 대비의
사진과 두꺼운 질감의 색면을 교차케 하며 보통은 서로 다른 차원에서 행해지는 인식들 사이의 일반적 경계를 재편해 나간다. 그리고 비로소 2021년 스페이스 소에서의 《Raw, Polished, Coated》 전에서 구상과 추상 그리고 가리거나 드러냄의 행위를 통해 구축하는 미적
균형감을 좇는 작가의 이미지 실험은 소위 ‘이미지-찾기-이미지’로 명명할 수 있을 그만의 독창적인 표현 양식으로서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이렇듯 이희준은 이미지를 중심으로 하는 회화의, 회화에 의한, 그리고 회화를 위한 자연스러운 연상의 흐름, 그 균형 잡기의 과정을
작업을 구조하는 부분이자 전체로 꾸준하게 정립해왔다. 나아가 그 정립된 구조를 내재하는 독특한 이미지, 그것이 일으키는 상호작용의 정수인 ‘본다는 것’의 의미를 그는 일종의 자기 파열적 테크닉으로 탄생시킨 ‘일련하는
구조로서의 회화 연작’을 통해 규명한다. 그 가운데 그의
회화 실험 혹은 실험 회화는 이전까지 전혀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던 이차원과 삼차원 세계 사이의 경계에 의도적인 혼란을 야기하고, 그로부터 회화라는 매체를 장르로서의 회화라는 새로운 체계로 이전시키며, 이로써
작가는 복잡하고 다단한 예술 실천의 조건들을 동시대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새로운 미적 인식틀의 가능성을 발견한다.
***
장진택은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큐레이터이자 연구자이다. 영국 왕립예술대학(Royal College of Art)에서 현대미술 큐레이팅(Curating
Contemporary Art)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이후 한국의 홍익대학교
예술학과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일민미술관, 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 인사미술공간 등지의 기관에서 전시를 기획하였고,
기획 전시 플랫폼 INTERACTION SEOUL을 독자적으로 운영키도 했다. 현대자동차가 운영하는 ZER01NE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의 팀장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독립 큐레이터로서 동시대성에 기반한 한국의 큐레이팅 실천 및 그 형성 과정에 관심을
두고 전시와 텍스트를 생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