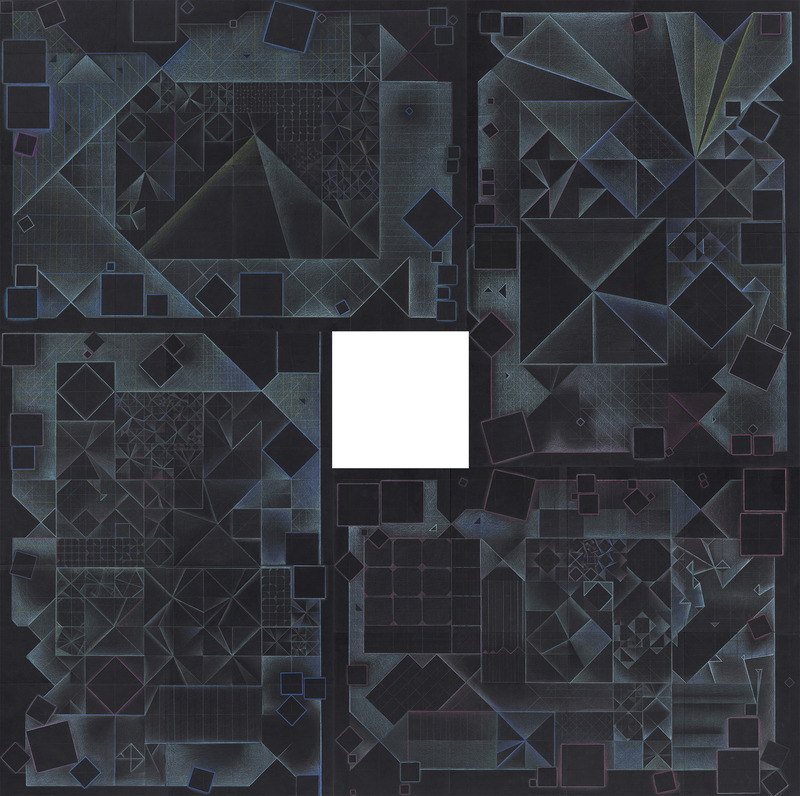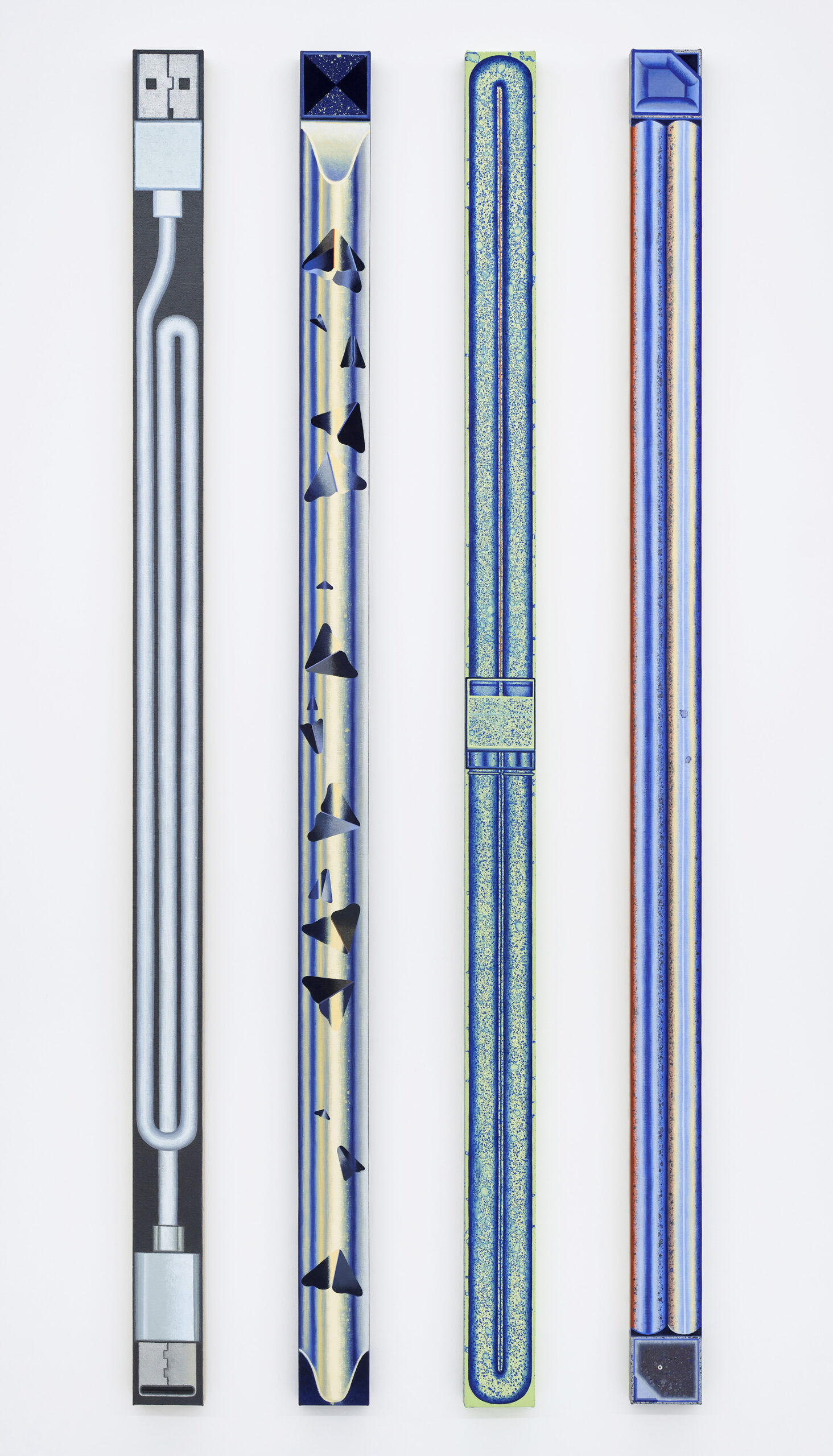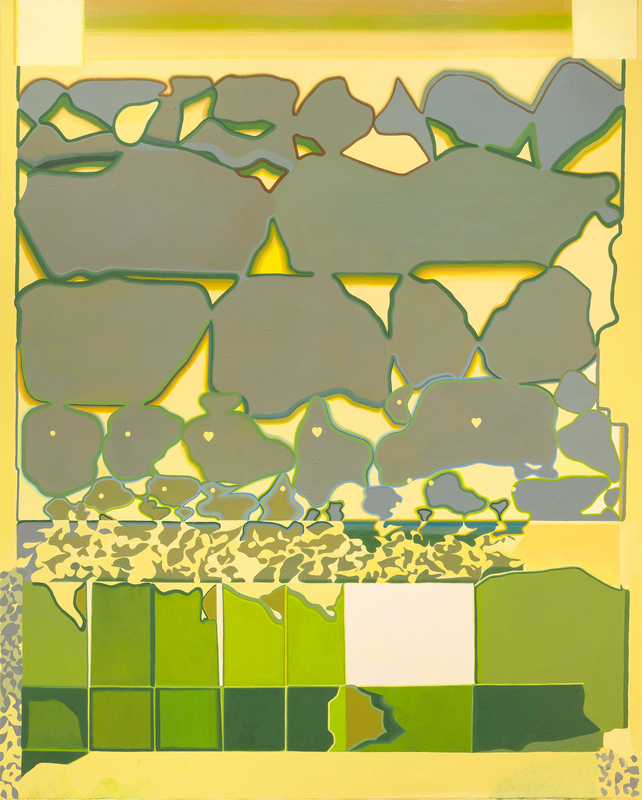개인전 (요약)
박정혜가 개최한 개인전으로는 《제텔카스텐》(스페이스 애프터, 서울,
2025), 《고대의 냉장고》(실린더2, 서울, 2024), 《Jetlag》(N/A,
서울, 2024), 《Mellow Melody》(휘슬, 서울, 2021), 《Xagenexx》(온그라운드2, 서울, 2017) 등이 있다.
그룹전 (요약)
또한 박정혜는 《인 시투》(아르코미술관, 서울, 2025), 《Contours of Zero》(제로원 스페이스, 뉴욕, 미국, 2025), 《도상의
추상》(서울대학교미술관, 서울, 2025), 《Open Corridor》(인터럼, 서울, 2024), 《SUNROOM》(BB&M, 서울, 2023), 《삼원소》(SeMA 벙커, 서울, 2022), 《두산아트랩 전시 2021》(두산갤러리, 서울, 2021), 《층과 사이》(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17)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레지던시 (선정)
박정혜는 2025년
아르코 예술창작실, 서울시립미술관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에서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작품소장 (선정)
박정혜의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정부미술은행, 서울시립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