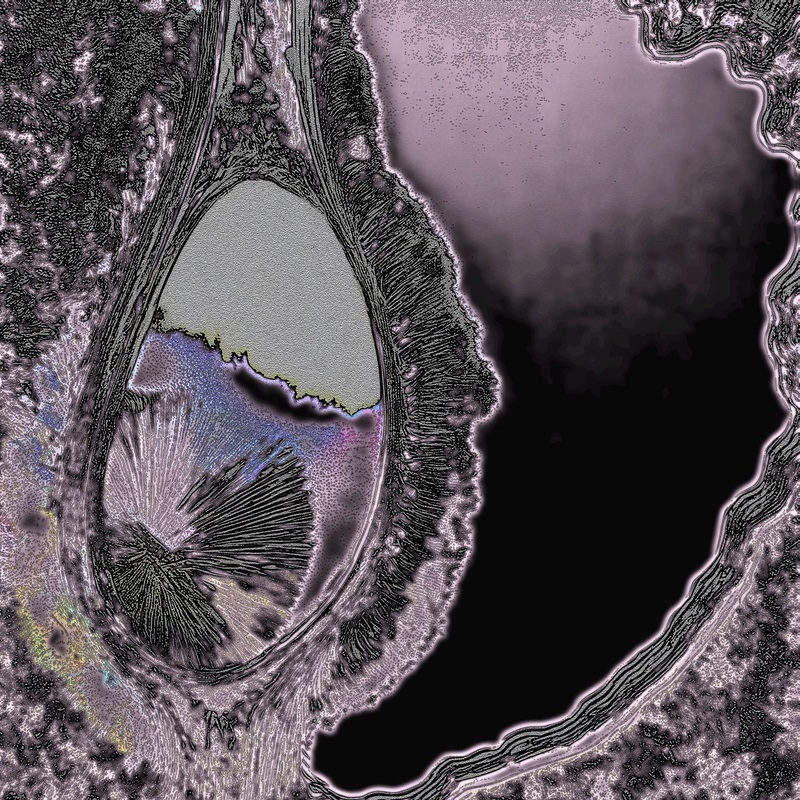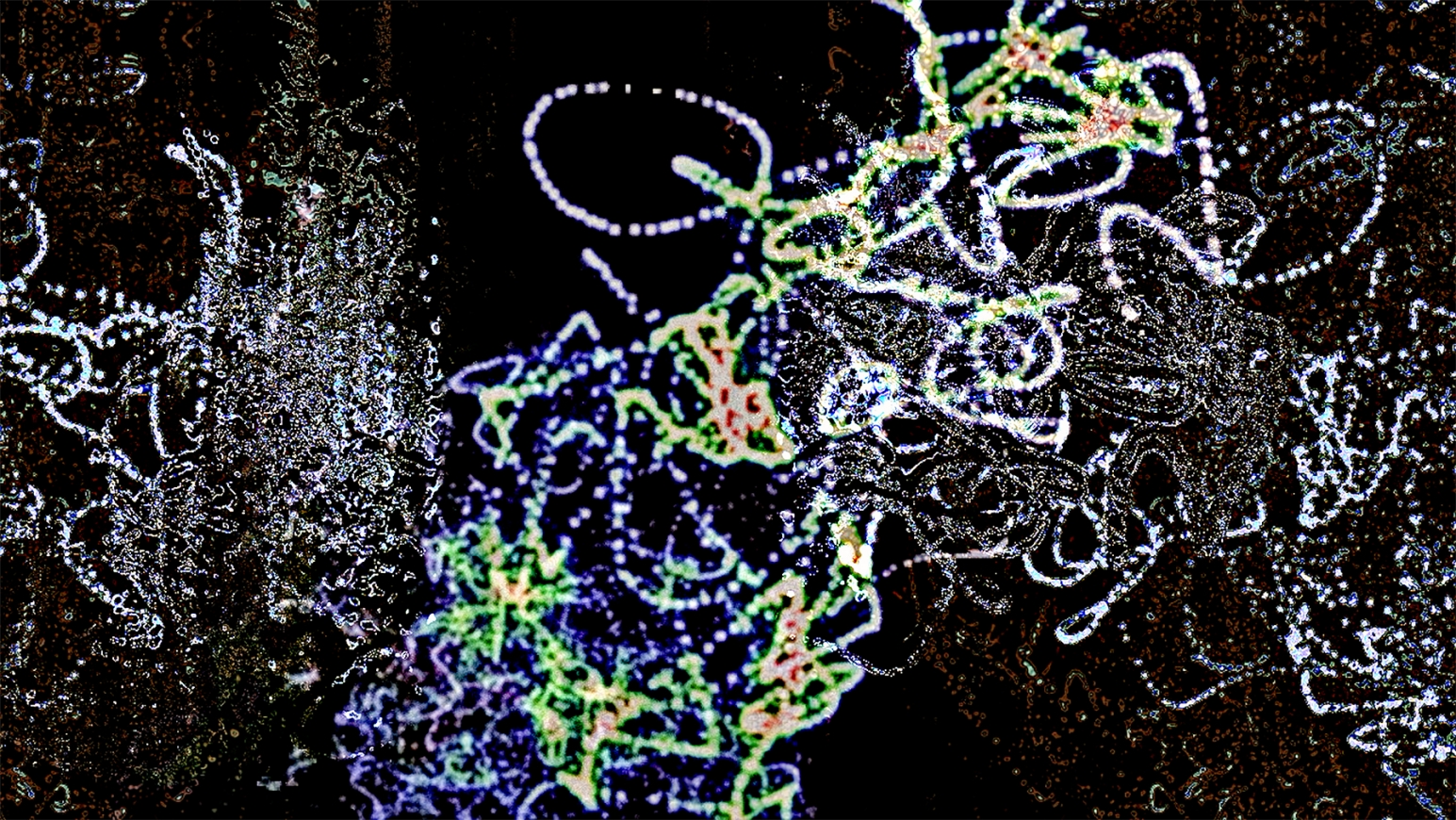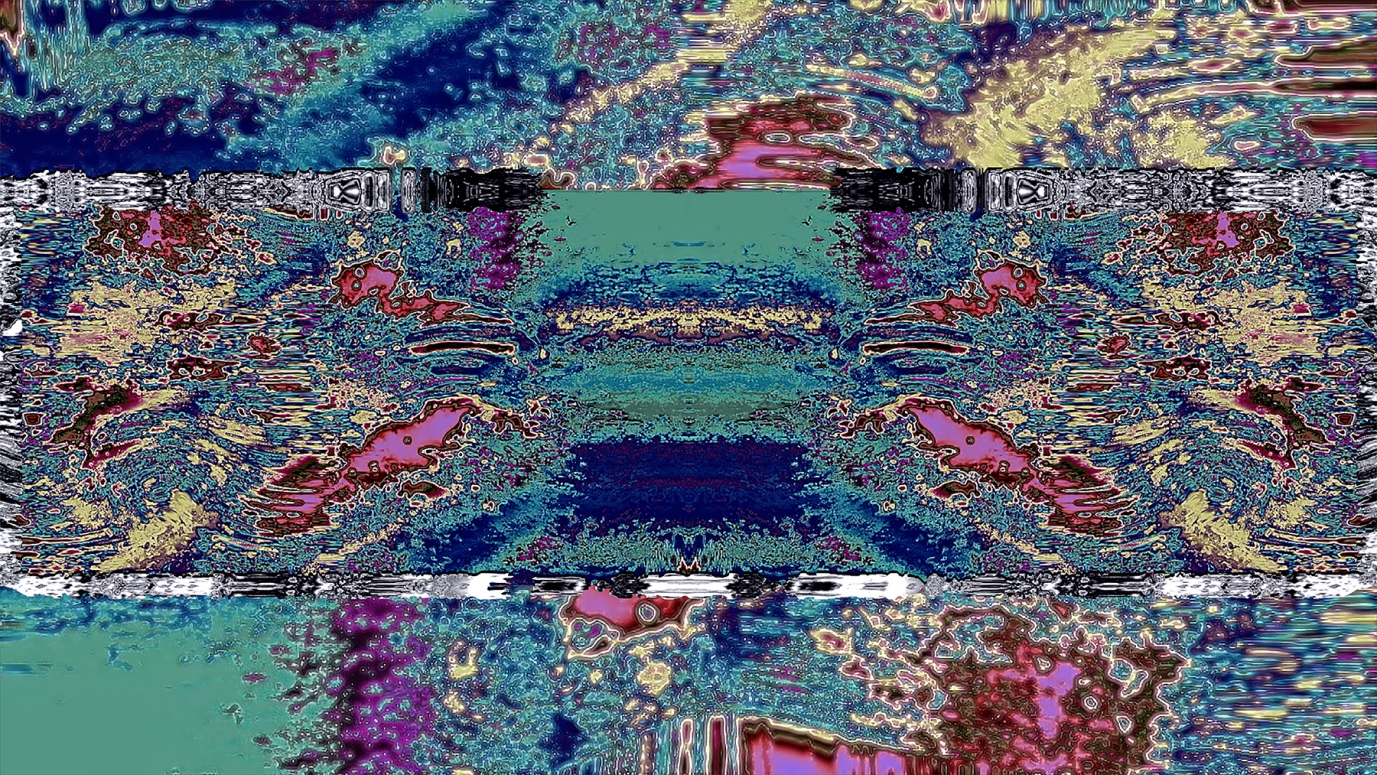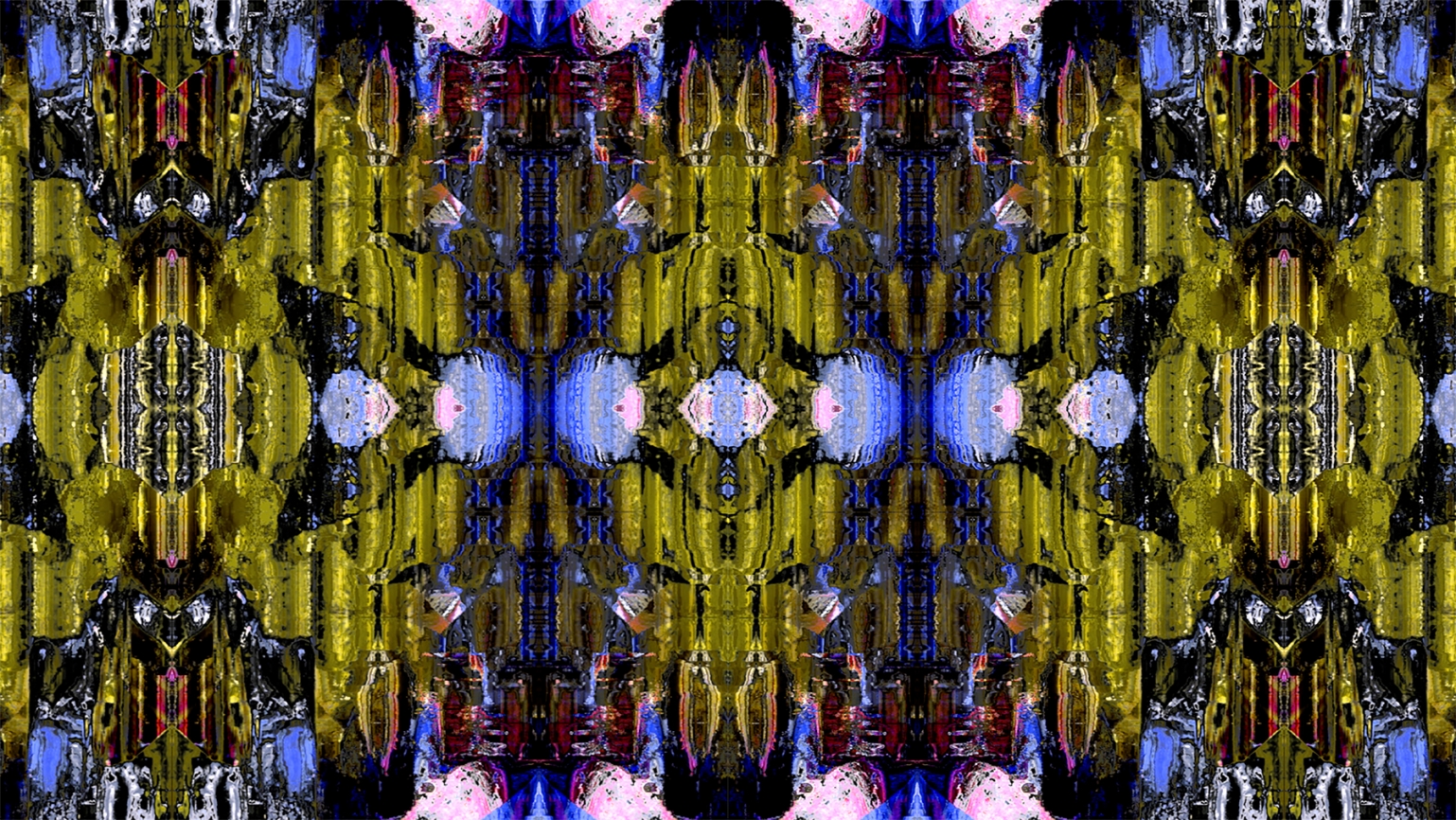세상은
자꾸만 무언가를 하라고 한다.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야 한다. 서
있지 말고 걸어가야 한다. 걸을 시간에 뛰는 게 좋고 뛸 거라면 더 빠르게 가는 게 낫다. 해야 하는 것의 목록이 끝이 없다.
철학자
베르나르 스티글러는 ‘고용’과 ‘일’을 구분한다. 두 단어 모두 통상적인 쓰임과 다르다. 먼저 일이란, 무언가를 성취함으로써 앎을 키우는 행위다. 일이란 앎을 표현하는 것이며, 실존을 위한 행위에 가깝다. 반면 고용은 다르다. 고용을 통해 일하게 되면서 인간은 자신의 일로부터
소외되었다. 스티글러는 19세기 초, 기계가 인간을 대신하며 일이 직공의 손을 떠났고, 그 이후 두 세기에
걸친 자본주의의 발달 과정에서 앎이 점차 궁핍화되었다고 본다. 그는 우리가 고용에서 벗어나 일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을 되찾기 위한 행동은 다양한 것, 의외의
것, 꿈도 꾸지 못했던 어떤 것을 창출한다고 말했다. 고용이
엔트로피적인 것이라면 일은 그와 반대되는 것, 네겐트로피적인 것을 만들어낸다.
일
혹은 고용. 두 개념을 곱씹으며 미술관을 떠올렸다. 화이트큐브에
들어서는 순간, 해야 하는 것이 생겨난다. 공간에 놓인 것을
쫓아가며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집중하여 분석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미적 관조’라는 건 내적으로 침잠하는 고요한 활동이 아니라 바쁘고 소란스러운 활동에 가깝다. 미술관에서
나는 항상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고 느꼈고, 더 치밀하게 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미술관은 사회와 분리된 제의적 공간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명령은 여전히 작동한다. 엔트로피가 상승한다.
송다슬은
영상, 전시장 벽 설치, 렌티큘라 렌즈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이미지를 전시한다. 이렇게 전시된 이미지는 ‘글리치’에 가까워 보인다.
글리치란,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해당
오류가 스크린에 시각화된 양상을 가리킨다.
어떠한
형상으로 결정화되지 못하고, 망가지고 깨어진 듯한 송다슬의 작업은 오류가 발생한 스크린과 비슷하게 보였다. 작가는 이러한 이미지를 만들어 벽을 뒤덮거나, 단순한 파형으로 반복되는
영상을 제작한다.
송다슬은
과거 전시에서 자신의 작업을 페넬로페의 베 짜기에 비유했다. 그리스 신화 속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고향을 떠난 뒤 약 20년 동안 세계를 방랑했다. 그동안
고향에 남겨진 오디세우스의 아내 페넬로페는 수많은 구혼자의 구혼에 시달렸다. 페넬로페는 시아버지가 입을
수의를 완성하기 전까지는 재혼할 수 없다며 구혼을 거절했는데, 낮에는 베를 짜고 밤에는 실을 다시 풀어내며
수의의 완성을 끝끝내 지연시켰다.
여기서
페넬로페는 무언가를 완성하는 주체가 아니라 실패하는 주체다. 페넬로페와 같이, 송다슬 또한 자신의 작업과 함께 무언가가 실패하고 끝없이 지연되기를 바라는 것 같았다. 작가는 관객을 미술관에 임시적으로 설치된 어둠 속에 데려다 놓고 작업을 바라보게끔 했다. 통상적인 영상의 경우 어떠한 형상이나 이야기가 보여지곤 한다. 그러나
송다슬의 작업에는 형상이 없고, 이야기가 없고, 관객은 단지
깨진 듯한 이미지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많은 작업은 끊임없이 상승하려는
엔트로피의 논리에서 벗어나 네겐트로피를 생산하려는 글리치였다.
영국의
영화 잡지 『사이트 앤 사운드』는 10년 주기로 역대 영화 순위를 조사해 발표한다. 2022년 발표된 목록에서, 기존에 1위를 차지했던 〈시민 케인〉, 〈현기증〉을 제치고 길고 지루하기로
유명한 영화감독 샹탈 아커만의 1975년 작 〈잔느 딜망〉이 1위를
차지해 화제가 되었다. 이 소식이 퍼지며 소셜 미디어에서 샹탈 아커만의 과거 발언이 주목 받았다.
“나는 누군가의 삶으로부터 2시간을 빼앗아 간다”는 말이었다. 내게 지루함을 주는 영상들, 시간의 흐름을 그대로 느끼게 하는 순간을
마주칠 때마다 반사적으로 그 말을 떠올렸다. 송다슬의 작업에는 러닝타임이랄 것이 없고, 그렇기에 끝없이 작업을 바라볼 수 있다.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하지
않으며, 삶의 모든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