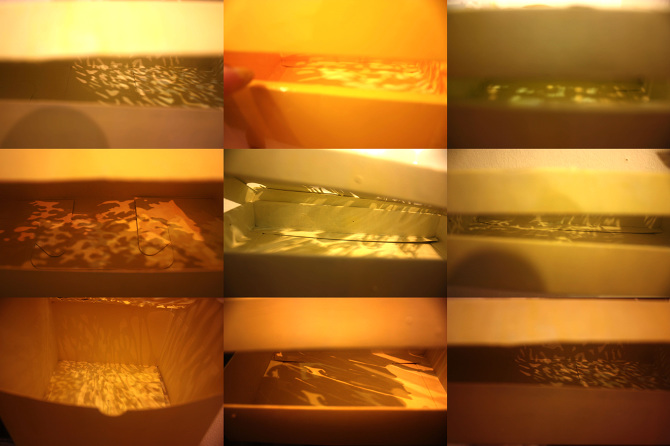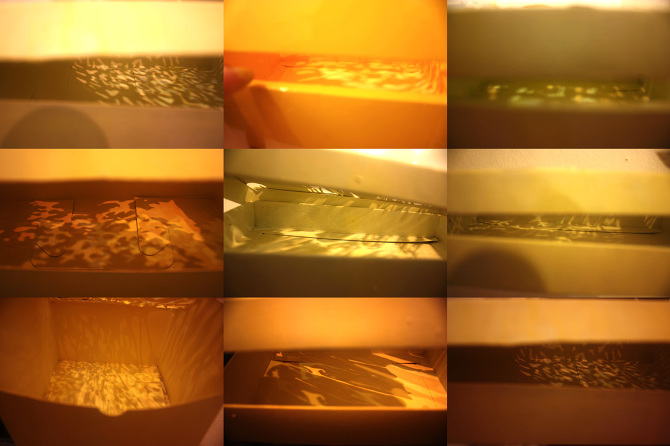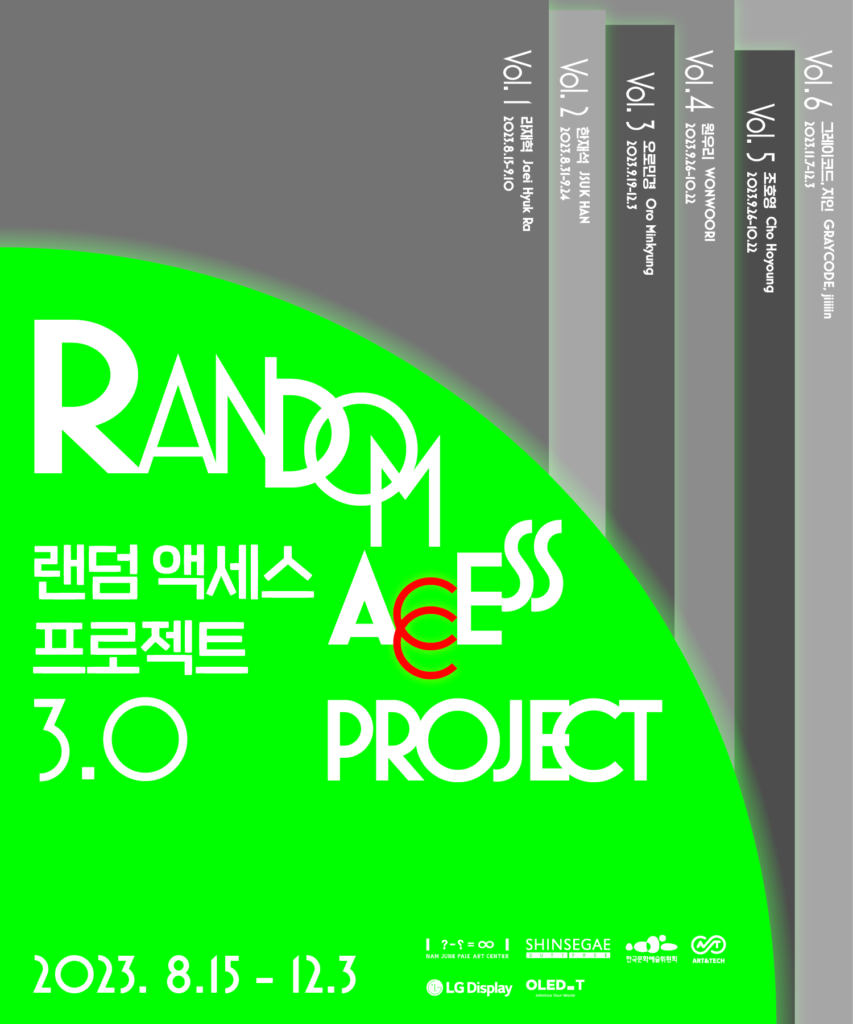프로젝트를
위해 리서치를 하던 초기에 인상 깊게 본 자료가 청각장애인 작가 크리스틴 선 킴(Christine Sun
Kim)의 테드 강연 ‘매혹적인 수어의 음악’이었다. 강연에서 작가는 자신과 무관할 줄 알았던 소리가 어떻게 자신과 가깝게 존재하고 있었는지를 설명한다. 청인의 언어는 선형적이지만 미국 수어는 공간적이어서 마치 화음 같다는 말이 인상적이었다. 이후 영상이나 공연, 다큐멘터리를
보며 미국 수어뿐 아니라 한국 수어도 굉장히 공간적이고 음악적으로 다가왔다.
리서치
기간 중 대화를 나눠준 두 명의 청각장애인 작가를 통해, 우리가 꼭 같은 방식으로 소리의 파동을 감각하지
않더라도 각자 경험하는 소리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두 명 다 인공와우 수술을 했는데, 한 사람은 수어를 하고 한 사람은 수어를 하지 못했다. 청각장애인
안에서도 서로 다른 소리 컨디션과 태도, 문화가 존재한다. 인공와우는
달팽이관의 기능을 대신해주는 장치인데, 농인은 이것을 통해 소리를 청인의 감각으로 공유할 수 있다.
하지만 가끔 잡음이 생기기도 하고, 거리에 따른 소리 크기의 조율이
필요해서 완전히 청인과 비슷한 상태가 되긴 어렵다고 한다. 인공와우는 들리는 것과 들리지 않는 것 사이를
오가는 정체성을 만들어준다고 한다. 덕분에 때로는 오해가 생겨서 더욱 외로울 때도 혹은 새롭게 탐구할
거리가 생기는 듯도 해 보였다.
두
작가는 개별적으로 만났는데,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듣기 컨디션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마스크 때문에 길에서 대화를 인지할 수 없는 상황, 인공와우 착용의
상태, 공간에서 들리는 소리의 크기 등. 흥미롭게도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내가 소리를 듣는 원리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소리라는 파동이 귀에 들어와
뇌에 전기신호를 보내준다.’ 매번 잊어버려 사전을 찾아야 했던 개념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몸을 통하니 이해가 되었다. 크린스틴 선 킴의 강연처럼, 내가 만난 두 사람은 소리를 굉장히 가깝게 의식하고, 또 잘 알고
있었다.
이
만남으로 우리가 꼭 같은 방식으로 소리를 느끼고 경험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소리나 음악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소리의 파동이 존재할 때 보이지 않아도 나에게 들리는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들리지 않아도 눈으로 볼 수 있거나 진동으로 느낄 수 있다. 더 나아가 우리 곁에 흐르는 어떤
파동이 들리거나 보이지 않더라도 사람의 몸과 마음에 내재한 다양한 방식의 물결로 흐르고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움직이는 몸의 리듬을 보면 그런 상상을 자주 한다. 하지만 이 상상을 만드는 문장이 청인인 나의 감각의
기준 속에만 머무른다면, 그저 비장애인의 무례한 낭만일지도 모르겠다.
한번은
청각장애인에게 문자통역을 지원하는 에이유디사회적협동조합의 ‘소통이 흐르는 밤’ 행사에 갔다. 앞서 소리에
대한 고민을 대화로 나눠준 작가 동료가 제안해준 자리다. 그곳에는 코다, 인공와우 수술을 한 농인, 수술하지 않은 농인, 청인 아이를 낳은 농인 부부 등 다양한 정체성의 청각장애인이 있었고, 식사
자리에서 몇 분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반가운 감정으로 서로를 소개하는 자리였지만, 내가 소리에 관한 작업을 하는 예술가이고 소리에 대해 질문하다가 이곳에 오게 되었다고 하니 대화가 조금은 막연해짐을
느꼈다.
동시에 나 역시 내 질문에 대한 관점이 옳은 것이었는지 자신감이 떨어져, 함께 자리한 이들의 이야기를 더 듣기로 하였다. 한 분은 농인을
위한 심리상담을 공부하고 있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강의가 비대면으로 바뀌는 바람에 문자통역이 필요한데
비용이 없어 걱정이라고 하였다. 나라면 정말 감당하기에 어려운 상당한 액수였다. 청인 기준의 소리 사회에서 농인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하는구나 싶었다.
‘나에게는
중요했던 소리의 장이 농인의 입장에서는 그저 불필요한 강요로 작동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날 나는 소리에 대한 나의 인식을 계속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공기로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이는 내가 그날 다수의 비청인 사이에서 소수의 청인으로 있었기에
체감할 수 있었던 경험이라는 생각이 든다. 더 많은 비장애인이 장애인 중심의 공간에 소수자로 초대되는
경험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을 관점의 전환이 계속 필요하다.
예술의 몫으로는 소리의 영역이 더 넓은 기준에서 다양하게 해석되어, 같은
것을 느끼지 않아도 함께 공명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생기길. 어설프거나 부침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의
경험과 이야기, 몸에 내재된 노래가 풍성하게 공유될 수 있는 여러 갈래의 길이 생기길. 나의 생각이 여전히 단단한 착각 속에 빠진 것은 아닐지 계속 두들겨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