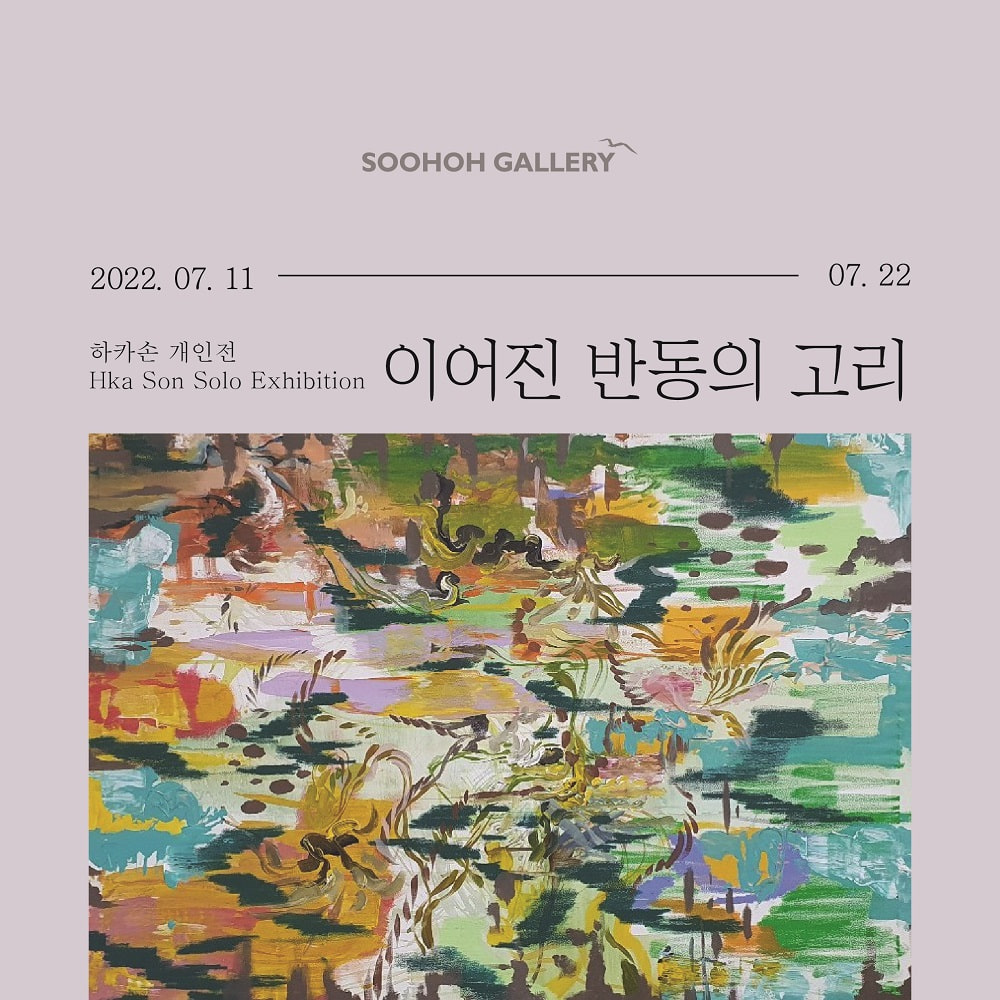“그래, 두 가지의 무대가 있어.
그
하나는 당연히 형상들이 보여지는 무대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걸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지만,
보이지
않는 곳으로 한발 뒤로 물러서 있는 무대이지.”1)
천장에
매달린 다섯 개의 존재(개체)를 보고 있노라면 여러 감정과
이미지가 동시에 스민다. 분명 산 쪽보다 죽은 쪽에 가깝다는 느낌마저 든다. 경쾌했다가도 정적 속에 거하기를 반복하는, 신체이면서 신체 아닌
것. 영혼을 담는 그릇으로써 신체를 정의한다면 하나같이 흉내내는 껍데기뿐인 것. 분절된 신체를 상기시키는 키네틱 오브제, 그리고 공간 전체를 감싸
안으면서 관통하는 빛과 음향의 협연 사이에서 하카손의 퍼포먼스 〈거울과 망토〉(2024)를 읽어내기
위한 몇 가지 단상을 담아본다.
막과
막
미디어아트에
더해 패션을 공부한 하카손에게 신체는 패턴을 뜨고 드레이핑 작업을 하면서 늘 직시하고 염두에 두어야 하는 대상이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거울’과 ‘망토’는 신체의 존재를 드러냄과 동시에 덮는 장치로도 기능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사실 퍼포먼 스 현장 그 어디에도 거울이나 망토는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무엇이 거울이(여야만 하)고, 무엇이 망토일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어서 (...) 그것에 대한 흐름을 시리즈로 작업하다가 그 흐름을 막는 장애막을 인위적으로
화면에 배치”했다는 설명은 이번 〈거울과 망토〉와도 직결된다. 공간
전체를 입도록 의도한 작가의 말은 이미 그 자체로 여러 층위의 막이자 망토를 형성하고 있다.
매개하는
신체
신체를
조직하고 있는 뼈대는 말이 없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안쪽에 자리한 작은 모터만이 이 모든 움직임을 가능케
할 뿐이다. 다섯개의 객체는 모두 바닥에서부터 직립해 올라가는 형태가 아닌, 위에서부터 매달려있는 형태다. 애당초 그에게서 애써 신체여야만 할
것 같은, 혹은 신체처럼 보일 법한 재료에 근접하려는 수고는 찾아볼 수 없다. 그의 전작 〈위로가고 앞서가고 따라가는〉(2022), 〈이완과 확장〉(2022)과 같이 손 재활 기구를 사용하거나 하체, 손, 신발과 같은 요소를 직접적으로 사용했던 때를 제외하고는 굳이 진짜 신체와 닮아야 할 것만 같은 노력은 그의
의도에 포함되지 않는듯 보인다. 차라리 ‘무엇으로도 있지
않음’2)에 가까운 인간과 비인간 사이 중립의 상태라 하겠다. 그의
오브제는 작가 듀킴과 협업했던 작품 〈진묘수(Armoured Evolver)〉(2020/2021), 또는 〈사이몸짓(The in Between
Gesture)〉(2022)에서처럼 직접적인 입기의 행위를 의도한 웨어러블 형식이었다가도, 대부분 독립적인 사물 그 자체로 온전히 존재하면서 신체와 막의 경계 가까이에 걸터앉기를 실험한다.
하카손은
〈거울과 망토〉에 등장하는 다섯개의 존재들에 이름을 붙일 때, 무엇이라 규정할 수 없는 비주체적인 존재를
의도했다고 한다. 인간도 아닌 미래적인 존재들에 걸맞은 이름을 객관적으로 부여하기 위해 작가는 Chat GPT에게 질문했고, 이렇게 얻은 이름에 추가적인 서술을
붙여 총 다섯 개체―미래적인 진(Quasar), 신성적인
범(Bolt), 효율적이긴 하지만 돌연변이 같은 휘(Sparky), 인간적인
연(Odin), 뽐내는 큐(Tinker)―의 제목을 완성했다.
흥미로운
점은 하카손이 본격적으로 설치작품에 빛과 그림자를 하나의 장치로 덧대어 사용하 면서부터 더이상 물체만을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공감각적으로 나아가 시공간에 대한 영역으로 작업을 확장시켰다는 데에 있다. 또한
이 확장은 (하카손을 떠올리기 어려운 매체이면서도, 최근
작업과는 매우 동떨어져 있는 듯 보이는) 드로잉 연작 ‘Windscape’(2011-)와도
즉각적인 연관성을 갖는다. 하카손의 신체는 스텔락(Stelarc)의
확장된 신체, 레베카 혼(Rebecca Horn)의 의인화된
기계, 혹은 신체를 통해 역사와 서사를 담거나 발언의 장으로 삼아온 여러 예술가들의 접근과는 구별된다. 미술사적 맥락에 있어 시대를 달리하며 신체가 차지해 온 궤적을 톺아볼 때, 신체에
대한 하카손의 관점은 사뭇 다르게 다가온다.
걸쳐진
경계
작가는
천정고가 높은 플렛폼엘의 라이브홀 공간을 마주하면서 패션쇼 형식의 퍼포먼스를 떠올렸다고 한다. 통상적으로
패션쇼에는 모델들이 누비는 런웨이 무대가 중앙부에 위치하고 양옆 어두운 곳에는 무대를 응시하는 관객이 있다. 하지만
하카손의 (이른바) 패션쇼에 초대된 관객들은 정반대의 위치에
놓인다. 모델(오브제)과
관객 사이의 별다른 무대 구분이 없는 하나의 공간 안에서 관람자는 퍼포먼스의 다양한 각도와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자연스레 이동(해야만) 한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스페인 안무가 마리아 라 리보(María José Ribot)가 〈파노라믹스〉(1993-2003) 작품을 통해 관객과 무대의 관계 재배치를 시도했던 사례와도 맥을 같이 한다.3) 하카손은 퍼포먼스를 크게 세 개의 챕터―A파트는 이동, B파트는 체결 해체 모방, C파트는 몸과 공간의 섞임, 춤―순으로 구성했다. 워킹, 턴, 포즈와 같은 패션쇼의 고정된 동선과 레퍼토리는 그 사이를 오가는
관람자에 의해 뒤섞이고 확장되면서 새로운 장을 맞이하게 된다.
빛과
소리의 투영
사운드
디자이너 김보경과의 협업으로 완성된 이번 퍼포먼스에서 사운드는 작품 전체를 경유하는 반사적 요소로 작용한다. 하카손
작품에서 빛과 소리가 차지하는 위치는 이 글을 시작하면서 인용했던 문구의 일부인 ‘보이지 않는 곳으로
한발 뒤로 물러서 있는 무대’를 상기시킨다. 어두운 공간에서
관람자에게 가장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요소는 핀조명을 받은 다섯 객체이겠으나, 이내 공간 전체를 투영하는
빛과 소리, 그림자에 의해 비로소 무대가, 그리고 신체 가
완성된다. 2023년에 선보인 개인전 《배우체(Gametophyte)》에서
역시, 공간 중앙부에 길게 자리했던 물의 파동과 빛의 반사가 거울처럼 기능하면서 공간 전체를 감싸는
접근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렇듯 하카손이 작업에 빛을 불러오는 방식은 〈고리에서 꼬리까지〉(2022)를 비롯한 대부분의 경우에 직접적이지 않다. 여러 각으로
반사된 빛은 줄곧 투명한 재질에 투과되어 퍼지기도 하고, 그림자가 되어 2차, 3차로 공간 전체를 경유하며 맴돈다.
턴, 포즈, 턴
사실
하카손의 작업이 더 궁금해지기 시작한 건 초기 드로잉 작품을 접하면서부터다. 초기 드로잉과 현재 작업하는
매체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작가는 “평면은 너무 나의 몸과 맞닿은 느낌이라 다른 매체를 통해 어느
정도 거리감을 두고 싶었다. 몰입이 되어서 몸과 너무 가까우면 좋기도 하지만 고통이 더 컸다”고 답했다. 하지만 약 10여
년의 시차를 두고 맞이한 퍼포먼스 현장에서도 여전히 드로잉을 마주할 수 있었다. 빛과 그림자, 사운드에 의해 (공간 전체에 걸쳐)
계속해서 교차하고 축적되는 일종의 ‘공간 그리기’ 행위로써
말이다. 하카손은 오스카 슐레머(Oskar Schlemmer)의
삼부작 발레(Triadic Ballet), 알렉산더 맥퀸
(Alexander McQueen)의 2005년 S/S 컬렉션
쇼 ‘It’s Only A Game‘과 같이 패션, 무용
등 다방면에 걸친 레퍼런스를 통해 더욱 입체적으로 ‘공간 그리기’를
탐구하고, 공간의 가변성을 실험하고자 했다. 삼부작으로 구성된
〈거울과 망토〉 퍼포먼스는 파트별 성격이 뚜렷이 구분되면서 빠르게 화면전환 되는데, 그 중 (작가의 의도를 구체적으로 엿볼 수 있는) C파트는 다음 과 같이
전개된다.
dance
- (on/off) 새로운 공간 안에서의
상태
변화 시작(느낌: 고체-액체-기체, 연속동작, 변신) - 2분
(체결-분해-채결-분해 반복)(쌓이고, 부서지고, 묶고, 풀고, 입고, 벗고, 몸을 감싸고, 몸을 쓸어내리고, 벗기고, 펼치고, 접는다, 늘어나고, 줄어들고, 팽창하고, 수축하고, 얼고, 녹고, 틀어지고, 분해되고, 접합되고, 감추고, 드러내고)
(초시계) (춤추는 소리) (무한공간) (무한몸) (전환) (탈선) (변화하고
갱신된다)4)
무대를
입은 몸, 몸을 입은 무대
어쩌면 ‘거울과 망토’는 단일 퍼포먼스의 제목을 넘어, 그간 하카손이 선보여온 모든 작업세계를 함축하기에도 충분해 보인다. 하카손의
작업은 투명과 불투명이라는 두 개의 축을 사이로 ―차갑고 딱딱한 성질,
그리고 유연하고 연약한―상반된 속성이 늘 뒤섞이고 충돌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걸쳐진 형태로
확장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물질을 형태에 가두는 느낌에 답답함을 느끼고 선으로만 표현했다”는 (초기 드로잉 작업에 관한) 작가의
말에서 이미 그가 주어진 화면의 바깥―평면에서 입체, 입체에서
공간―을 향하고 있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몸의 가변성, 일시성, 양면성’5)을
넘어 공간으로의 확장성과 가변성을 고민하는 작가를 떠올리면서 아래 문장을 다시금 곱씹어본다.
‘몸’은 그러므로 이미 무대이네6)
1)
필립 라쿠-라바르트, 장-뤽 낭시, 『무대』, 조만수 옮김(문학과지성사,
2020), 32.
2)
장 폴 사르트르, 『존재와
무』, 정소성 옮김(동서문화사, 1994), 472.
3)
안드레 레페키, 『코레오그래피란
무엇인가』, 문지윤 옮김(현실문화, 2014), 174-177
4)
하카손 작가와의 인터뷰(이보배, 2024.10.)
5)
하카손 작가와의 인터뷰(이보배, 2024.10.)
6)
필립 라쿠-라바르트, 장-뤽 낭시, 『무대』, 조만수 옮김(문학과지성사,
2020),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