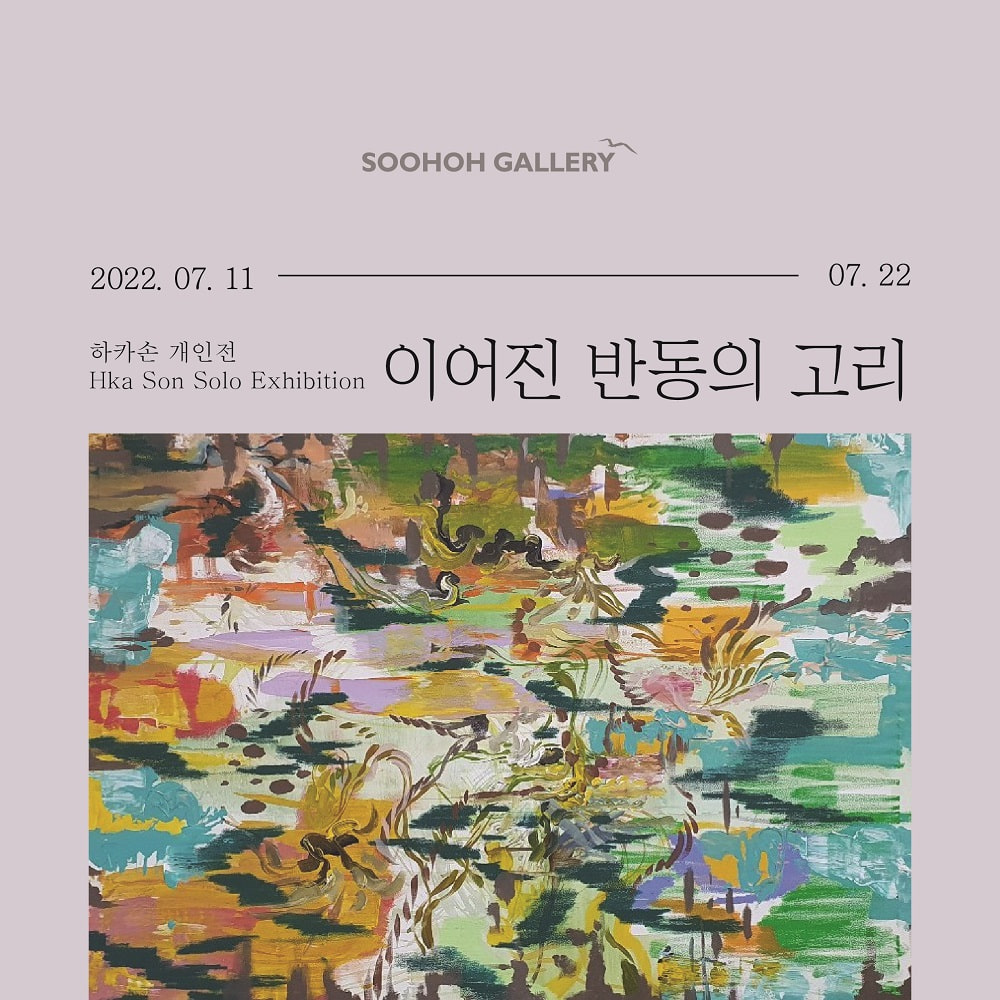전시장
공간의 중앙을 차지한 커다란 수조. 그 양쪽에 반짝이는 금속 문이 달려있다. 양쪽 문 바깥 방향으로 눈길을 가져가 벽까지 닿으면, 사람 키 정도
높이의 금속 구조물도 보인다. 단단한 금속 구조는 공기를 채워 넣을 수 있는 말랑하고 투명한 재질의
무언가를 입고 있다. 다른 한쪽에도 휘어진 금속판이 둘려 있거나, 때에
따라 선처럼 늘어지는 조명 장치 같은 것을 걸치고 있는 경우도 포착된다. 인체 스케일에 무언가 걸 수
있는 형태를 가진 그것은 얼핏 옷가지가 걸려있는 행거처럼 보이기도 한다. 생각해 보면 단지 사물들의
결합일뿐인데, 그것들에서 옷이나 옷과 결합된 신체성 혹은 신체성의 부재를 떠올리고 있다는 점을 먼저
짚어보자. 하카손이 만들어낸 공간과 그 안의 사물들의 움직임을 조직하는 방식이 애초에 사물과 신체의
문제를 겹쳐 놓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카손의 이번 작업은 명확한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한다. “인체의 유려한 움직임이 조형의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대체되고 자연스러움이 한순간에 인위적으로 변모할 때, 인위적인 움직임은 어떤 방식으로
극적이고, 퍼포먼스적인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바탕에 두고 있기 때문인지 작업을 선보이는 방식부터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다. 이번 작업은 일반적인
키네틱 조각처럼 전시장에 놓여 계속 같은 방식의 움직임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특정한
움직임의 구성을 선형적이고 극적으로 펼쳐낸다. 키네틱 조각보다는 퍼포먼스의 형식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작업이 보여주는 것은 오직 기계 장치들의 움직임뿐이다. 수조
양쪽에 달린 문의 열림과 닫힘, 연기를 뿜어내는 포그 머신, 조금
더 감각을 확장하면 수조에서 서서히 녹고 있는 얼음의 움직임과 상태 변화까지. 여기에서 기계의 움직임이
가지는 극적인 역량을 드러내기 위함인지 하카손의 퍼포먼스는 전통적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선형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다. 물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사물은 양쪽의 금속 문 밖에 없지만 이를 통해 도입,
고조, 절정, 소강 등의 흐름이 말 그대로 극적으로
표현된다. 천천히 한쪽으로, 때로는 빠르게 번갈아 가면서
움직이는 문들은 그것의 기계적인 움직임만으로도 어떤 이미지와 서사를 상상하게 만든다. 하지만 퍼포먼스가
진행되며 그 시공간이 만들어내는 감각에 연동되어 갈수록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감지된다. 바로 기계의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다층적인 파동들이다.
밑부분이 물에 잠겨있는 양쪽의 문은 수조에 끊임없이 물의 파동을 만들어낸다. 그 물결은
그 자체로 이미지가 되었다가, 물에 동동 떠 있는 얼음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 양쪽의 파동이 서로 부딪혀 뒤섞이며 힘의 관계를 드러내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한번 감각된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파동은 공간 전체를 은은하게 휘감고 있던 포그 머신의 연기 또한 다시 감각하게 만든다. 연기는 문의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바람이나 작업을 함께 보고 있는 사람들의 움직임에 반응하면서 사물들이 무형의
에너지를 주고 받는 모습을 가시화한다. 기계의 움직임에서 시작한 퍼포먼스는 점점 더 형식화된 시공간
안에 있는 (관객의 신체를 포함한) 모든 사물들의 움직임을
형식 안으로 들여온다. 화이트큐브 특유의 관람 방식에서 관객들이 서로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받으며
만들어내는 상태 역시 작업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공간을 돌아다니며 다른 사물들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관객들의 위상은 물 안에서 파동에 몸을 맡기고 이리저리 움직이며 점점 녹아내리고 있는 얼음의 위상과 겹쳐진다. 다양한 차원에서 사물과 신체가 이상하게 포개어지는 것을 감각할 수 있다.
그렇게 확장된 감각은 점점 더 뻗어나가며 전시장의 건축적 맥락을 재인식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차원은 특히 문의 운동성과 물질성이 함께 작동하면서 확장된다. 작동하고 있는 문 앞에 서면 그것의 움직임에
따라 시야가 차단되었다 다시 확장되었다를 반복하는데, 문제는 문이 닫혀있는 상황에서도 반짝이는 문의
표면에 공간이 비치면서 오히려 공간을 더 넓게 감각하게 된다는 점에 있다. 거울처럼 빛나는 표면을 가진
육중한 스테인리스 철문의 움직임은 마치 공간 전체를 휘젓는 것처럼 보인다. 나아가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면서
동시에 차단하기도 하는 문의 이중성을 생각하면 안쪽과 바깥쪽이라는 이분법 자체가 여기에서 흐려진다. 닫혔을
때 오히려 무언가 보게 된다는 점은 사물들의 움직임뿐 아니라, 그 움직임이 열어내어 확장되는 감각적
영역을 작업의 일환으로 여기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렇게 특정한 방향으로 확장되는 안과 바깥에
대한 감각은 〈배우체〉라는 작업이 만들어내고 있는 특정한 맥락, 즉 사물과 신체, 인공과 자연, 기계적인 것과 유려한 것의 교차와 함께 작동하며 우리의
이분법적 인식이 가지고 있던 구조를 가로지른다.
여기에서 하카손이 이번 작업을 그의 웨어러블 스컬프처 작업, 즉 착용할 수 있는 조형의
맥락에 놓고 있다는 점을 짚으면 조금 더 나아갈 지점이 보인다. 우리는 매일 같이 옷을 입고 있기에
특별히 생각하지 않지만, 입는다는 개념을 톺아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사물 안에 몸을 집어넣는 일이고, 신체와 사물을 특정한 방식으로 결합시키는 일이다. 우리가 주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몸은 일상적으로 옷이라는 외부의 사물과 붙어 있다. 물론 옷의 형태는 신체를 어느 정도 따르지만, 때로는 우리의 신체가
옷의 형태를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몸을 더 불편하게 하는 것이 분명한 격식을 갖춘 옷들을
생각해 보자. 그런 옷을 입을 때면 우리는 그 옷이 신체를 구조화하는 방식을 따르게 된다. 단지 육체적인 움직임뿐만 아니라, 문화적이고 상징적인 차원에서는
더욱 그렇다. 우리와 결합되어 있는 사물이 우리를 구조화하는 것이다.
하카손의 작업을 통해서 확장되는 감각은 사물과 사물의 결합뿐 아니라, 그것을 감싸고 있는
건축과의 관계까지 나아가고, 무엇보다 그 사이에 놓인 신체의 위상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사물들 사이의 관계를 옷과 신체의 관계와 나란히 놓으면서 다른 방식으로 사물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물이 옷을 입고 있다고 상상하는 것처럼, 우리가 건축을 입고 있다고
상상하면서 발생되는 어떤 확장을 생각한다. 이렇게 인간과 사물의 결합이라는 차원에서 옷을 사유하면, 패션이라는 장르에서 옷을 다루는 방식과 조형 예술에서 신체와 사물을 겹쳐놓는 방식, 그리고 건축에서 공간과 신체를 다루는 방식이 교차되며 기존과 다른 감각적 영역이 열릴 수 있다. 신체의 사물성, 사물의 신체성이 동시에 작동하는 이른바 포스트 휴먼적
국면에서 옷이자 조각이자 건축인 상태. 그러니까 방을 입고 있다는 재인식을 통해 기존의 감각적 제한을
벗어던질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