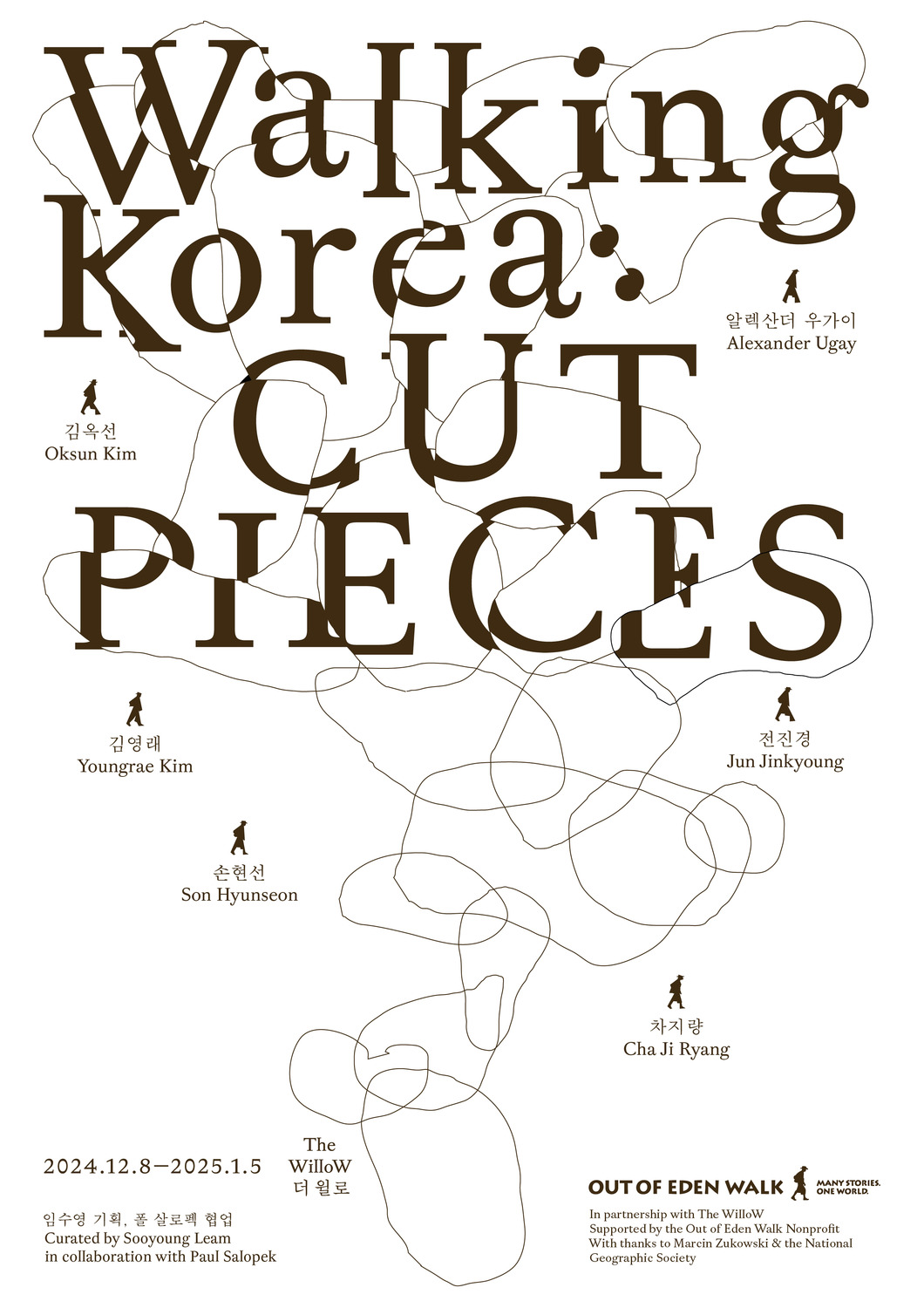손현선의
그림은 2015년 마지막 겨울에 처음 목격했다. 우연한 계기로
들렀던 성북예술창작터에서는 한예종 연계전의 형태로 개회된 퓨쳐스타일전(Future Style 展)이 한창이었다. 전시에서 가정된 미래는 아즈마 히로키의 ‘데이터베이스 소비론’을 따르고 있었다. 나는 전시 공간 안의 작업들을 평면의 예언 내지는 입체 기념물처럼 받아들였다.
아직 도래하지 않은 시대에 대한 일련의 마중들이 저마다의 부피를 지키고 있었다.
그때도
손현선은 천장 선풍기(Celling Fan)를 전시했었다. 각기
다른 건축물의 실내에서 회전하거나 멈추어있는 천장 선풍기 그림 수 점. 캡션에 작게 인쇄된 제목[Shape of Motion]이 무척 눈에 띄었는데, 정직하고 단호한
어투가 느껴졌기 때문이다. 같은 공간 안에 함께 설치된 김정태와 너님고속의 작업물들은 웹상에서 부유하는 jpg나 gif 이미지의 디지털 해상도를 수작업으로 변환한 것이었고, 그래서 직관적으로 전시 주제를 상기시켰다. 미래의 예술이라는 게
일시적으로 약속된 가상의 이미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임의의 좌표를 인식하고 그것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각각의 작업은 여전히 시각적 점지 자료로 남을 수 있었다. 그러나 손현선의 그림들은 화려하거나
우악스러운 조형법으로 재현된 작업물들과 홀로 멀리 떨어져있는 것 같았다. 일말의 기복 없이 간격과 열을
지켜 설치된 수 점의 선풍기 그림들은, 판형 위에 다른 호의 판형을 중첩해 얹거나, 섞거나, 그것들이 집합된 값으로 이어지도록 한 김정태의 설치 방법과도
달랐고, 이미지에 투사된 정치적 정념마저 집요하게 들추어 옮긴 너님고속의 설치 방법과도 달랐다. 처음 손현선의 그림을 마주하고 느낀 감정은 반가움이나 놀라움 같은 게 아니라 당혹감이었다. 손현선의 그림은 회화적 주제만큼이나 독립된 관람 방법을 요구했다. ―예컨대
그래픽 편집 소프트웨어식 문법으로 구성된 회화 기법에 감탄하거나, 물질적 재료로 오마주된 디지털 풍경에서
기시감을 느끼거나, 잘게 나뉜 도형이나 기호만으로 종이를 가늠해 회화의 한계를 의심하게 하거나, 건축용 자재와 폐건물들로 서울을 재조립하려는 일련의 시도들로부터 몇 걸음 비켜서있었다. 그림 앞에 서있는 동안에는 특정한 자각이나 지식마저 필요하지 않았다. 관객이
해야 할 일은 참고 버티는 것, 그게 다였다.
이번
전시에 가서 해야 했던 일도 오래 버티는 게 전부였다. 2년 사이에 대상은 선풍기에서 콘크리트 트럭으로
바뀌어있었다. 방명록 옆에 놓인 전시 소개문을 잠깐 읽고, 쓸지
말지 고민하다 이름을 적었다. 소개문에서 언급된 ‘회전하는
모든 것에 대한 이데아’라는 표현이 내내 기억에 남았다. 손현선의
그림을 일축하기 좋은 설명이어서? 혹은 손현선의 그림에 적확하게 적중한 문장이어서? 처음 천장 선풍기 연작을 봤을 때 나는 그 자리에서 숱한 설명을 상상해야 했는데, 그래야만 손현선의 그림을 받아들이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를테면
설명이 되는 그림. 대부분의 스테이트먼트는 작업에 대한 관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언술적 배려지만, 왜인지 손현선의 그림에 대한 스테이트먼트들은 읽으면 읽을수록 아리송해지기만 했다. (2015 퓨쳐스타일展의 스테이트먼트에서는 ‘반복적인 움직임의 대상을
그리는 과정에서 중심축은 사라지고 움직임만 남은 화면을 제시하여 심층이 사라진 ‘퓨쳐스타일’의 감각을 시각화하려는 시도’로 설명되었다) 그때 가까스로 떠올린 설명 가운데 하나가 이번 전시 스테이트먼트와 비슷했다.
이 작가는 사물의 본질적인 율동에 관심이 있나보다. 그래서 정지 상태가 아니라 회전 중인
선풍기를 그렸나보다. 실제로 회전하는 사물을 주제로 한 손현선의 그림에는 시속에 비례하는 회화적 표현(궤적, 흔들림)이 그대로
표현돼있다. 세 가지 설명 모두 손현선의 그림이 아니라 손현선에 대한 설명 같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손현선 없이 손현선의 그림에 대한 설명을 떠올려보려고 애썼다. 손현선의 그림 앞에 홀로, 있을 수 있는 만큼 머물러 서있어볼 수 있었던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사람들이
비워진 갤러리 내부는 명암만으로 구분된 공간 같았다. 그림의 간격만큼만 표정이 다른 중년의 남자, 멈춰있거나 회전 중인 천장 선풍기, 얼핏 봐서는 달의 분화구나 매끈한
표면에 새긴 원형 부조에 가까워 보이는 콘크리트 트럭 연작, 그리고 건물 바깥에서만 들여다볼 수 있는
유리창호 안의 천장 선풍기 연작까지 두루 견뎌보려고 애썼다. 특히 바깥 그림들은 차도와 가까워서 수시로
위험한 상황에 처해야 했는데, 그래서인지 더 견디는 기분이 들었다. 밀려났다가
제자리로 돌아올 때마다 파도의 기분을 헤아릴 수 있었다. 그림들 앞에서 견디는 시간이 축적되고 저절로
잊히기를 반복하는 사이, 나는 파도였다가 바람이면서 분위기였고, 동시에
기분이었다. 납득을 재촉하는 그럴싸한 설명들은 모종의 순서로 차분히 부정되었고, 종래에는 그림과 나만이 남게 되었다. 문득 어떤 생각이 멍한 주위를
두드려 깨웠다. 나는 메신저를 열어 내 앞으로 이런 문장을 적어 보냈다. “이 사물의 본질적 율동이 흔들림인 건지, 아니면 내 마음이 흔들려서
그렇게 보이는 건지 혼동하게 되는 순간이 오더군요.”
내가
만약 구球라면, 회전하는 동안에는 모든 사물이 회전 중인 것처럼 보일 것이다. 사물뿐 아니라 수평선마저도. 끊임없이 낙하 중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시시각각 무너져 내리는 풍경으로 관측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죠? 언젠가 들은 적 있는 이 질문을 내가 다시 던질 때, 나는 횡 혹은
종의 방향으로 무한히 돌고 있다. 회전 속도 때문에 말은 온전히 전달되지 못한다. 질문을 듣는 사람은 부분적으로 실종된 마디들을 스스로 추측할 수 있어야 한다.
버ㅌㅡㅑ죠. 한쪽으로 쏠려있는 표정으로 누군가 대답한다.
멀미 때문에 구토를 쏟아내면서도 고개를 끄덕인다. 버ㅌㅡㅑ죠. 그 말을 도로 돌려줄 땐 기분이 몹시 울적해진다. 이제 돌려줄 수
없어서?
건물을
나와 홍대입구로 나가는 길에 유튜브 검색 엔진에 Standstill을 넣고 돌렸다. Standstill보다는 Stand still과 가까운 목록이 대신
검색됐다. 영어 문화권에서는 주로 노래 제목으로 쓰이는 것 같았다. 스크롤을
내리다 더 아이작스The Isaacs라는 그룹의 Stand Still
[Live] 4)영상을 찾아 들어가보았다. 노래를 듣는 동안 이런 가사가 들렸다.
Stand
still and let God move,
Standing
still is hard to do
When
you feel you have reached the end,
He’ll
make a way for you
Stand
still and let God move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직립형 골격에 불안정하게 기대어있는 무수한 구sphere들과 마주쳤다. 그들은 무한히 회전 중이어서 마치 표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무표정은
정지 상태가 아니라 회전 상태에 더 가깝지 않을까. 일정 프레임 이상의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는 아예
정지해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니까. 마치 우리가 고속으로 회전 중인 타이어를 ‘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혼자
전시를 보러 다녀오는 일은 무척이나 드문 일이다. 최근에는 아예 나가지도 않았고. 그러나 ‘믿음’에 대한
누군가의 조언으로 오랜만에 용기를 내볼 수 있었다. 인용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스스로의 감성, 능력, 소질보다 다만 그림을 믿는다고 했다. 본인이 그리지만 그림은 언제나 그보다 앞서있기도 하고 뒤에 있기도 하다고. 두려울
때마다 스스로는 믿을 수 없지만 작품을 믿자고 생각한다고. 나는 오히려 내가 썼다는 이유로 내 글과
나를 분리해서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어쩌면 글을 결정하는 게 나의 감성, 능력, 소질 같은 거라고 착각해왔고. 하지만 그의 말대로 작품은 이따금 스스로 결정되기도 한다. 동료들이
좋아하는 몇몇 글들은 내가 잘 썼기 때문이 아니라 글이 좋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겸손할 필요도, 오만할 필요도 없다. 정직하게 견딜 수 있는
몸만이 필요하다.
요즘은
눈을 감으면 바신스키나 비제의 음악 대신 폐쇄 회로 화상 기기에 대고 기준선 문장을 반복 발음하는 K의
음성이 다성악처럼 군데군데 겹쳐서 들린다. interlinked. 글과 나를 독립된 유닛으로 취급해야
한다. within cells. 견디는 동안 나는 자비로운 신이나 베테랑 길잡이를 기다리는 대신 붕괴하는
내 세대의 풍경Generation-scape과 낙하감에 더 깊이, 가까이
주목해야 한다. 함께 떨어지고 있는 동료들이 묻는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죠? 나는 회전하며 대답한다. 버ㅌㅡ야죠. 모두가 보상 없는 인내를 하고 있다. 추락하고 있다. 긴장감 없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혹은 이미 오래 전에 실종된 지표면을 발밑에 상상하며, 이제 와서
모든 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바보처럼 말한다.
사당에서 30분마다 출발하는 시외버스 1008번은 우리 집과 사당을 잇는 직선의
도로들을 노선으로 쓴다. 모로 새는 길이 없다. 중간에 의왕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한 번 정차하는 게 전부다. 한산한 시간에 올라타면 20분만에
벨을 눌러야 한다. 버스에서 내가 하는 일은 음악을 들으며 창문을 보는 것뿐이다. 낮에는 바깥 풍경이 보이지만, 밤에는 내 얼굴이 보인다. 귀가 시간의 버스 안에서는 원하지 않아도 내 얼굴을 비스듬히 들여다보게 된다.
모든 것이 핑핑 도는spin 와중에도 멀미를 견디려stand
still 애쓰는 구sphere의 형상이다.
1)
이미지 출처 :
http://chapterii.org/chapter-ii-window-4/
2)
『스크린의 추방자들』, 히토 슈타이얼, 김실비
역, 워크룸프레스, 2016
3)
이미지 출처 : https://neolook.com/archives/20151213h
4)
The Isaacs – Stand Still [Live] https://www.youtube.com/watch?v=QlBFlEup9U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