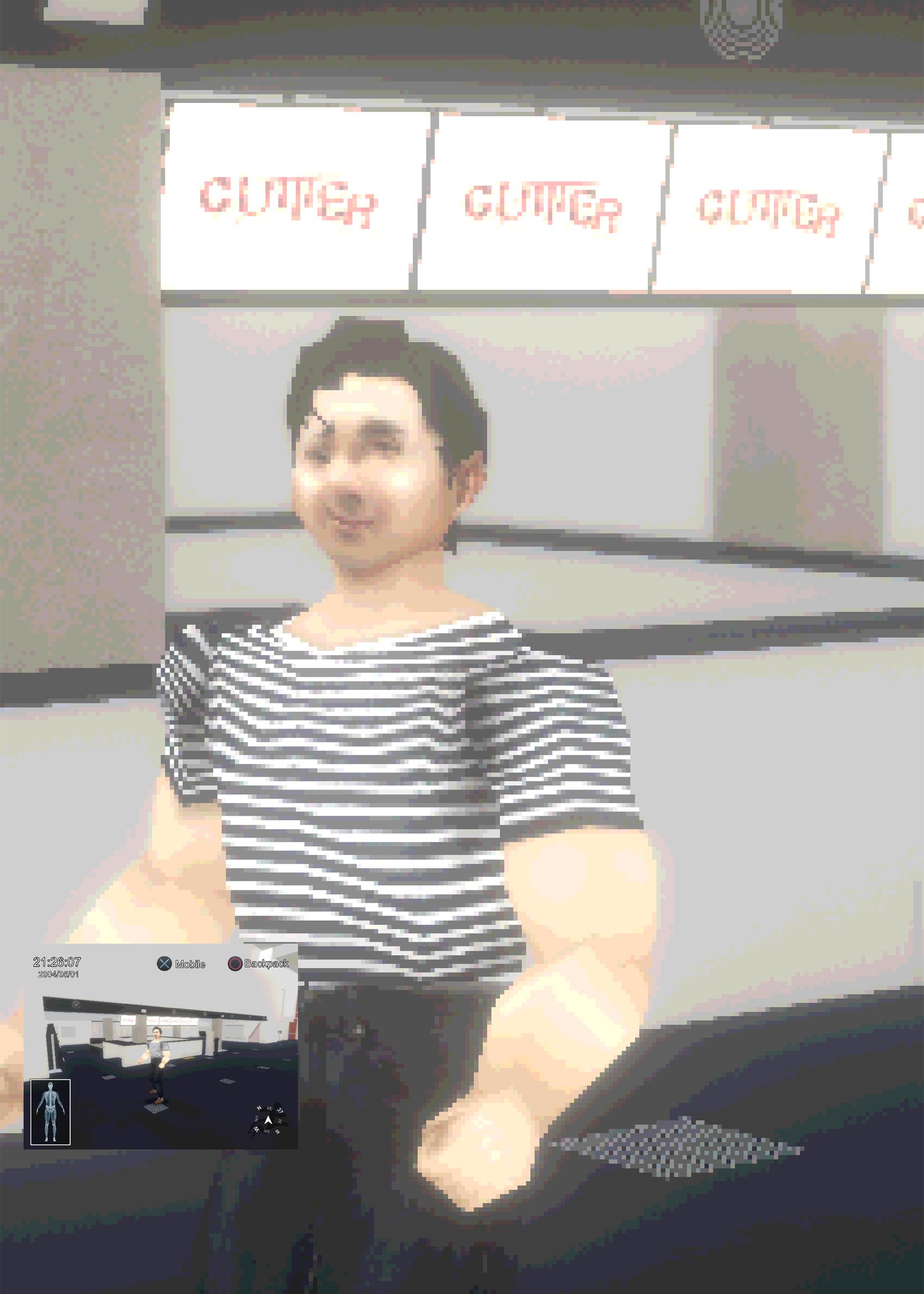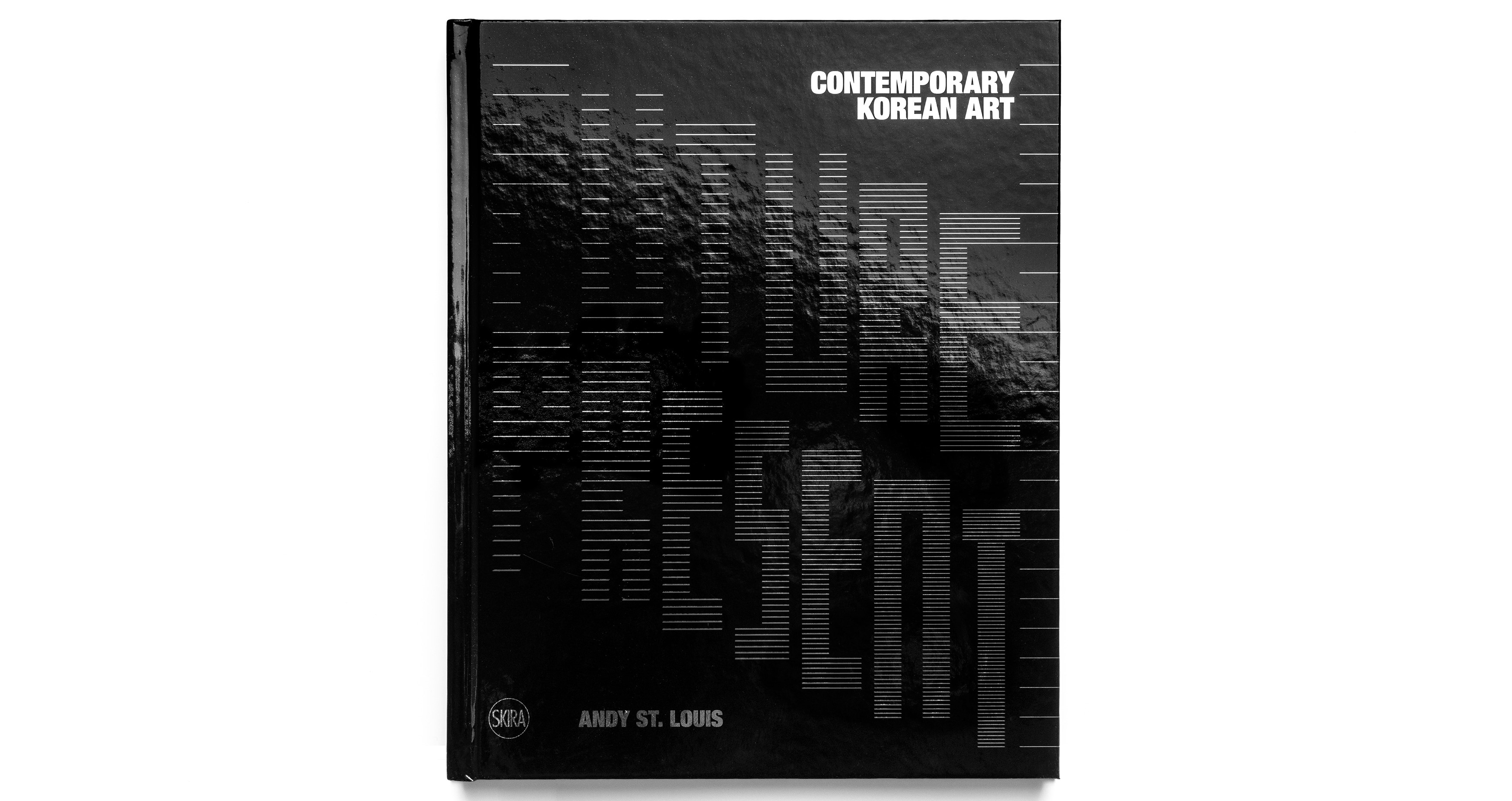김희천(1989년생) 한예종 건축과
졸업, 헤이워드갤러리(2023), 아트선재센터(2019),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미술관, 두산갤러리 뉴욕(2018), 커먼센터(2015) 등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루마니아 국립현대미술관, 메츠 퐁피두센터, 국립현대미술관(2023), 백남준아트센터, 경기도미술관, 부산현대미술관(2022),
리움미술관(2021) 아뜰리에 에르메스(2020),
ZKM(2019) 등에서 개최한 기획전에 참여했으며, 부산비엔날레(2020), 광주비엔날레(2018),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2016)에 초대됐다.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2023), 카이로 비엔날레 비엔날레상(2019), 두산연강예술상(2016) 등을 수상했다. ©월간미술
김희천은
디지털 기술, 가상 등이 실재하는 공간과 세계에 준 영향을 탐구하며,
디지털 인터페이스 장치들 – 3D, 페이스 스왑(FACE
SWAP) 앱, VR 등을 재료 삼아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이에서 부유하는 시공간을 포착해낸다. 프레임을 짧게 차지했다가 금세 사라지는 이미지와 사운드로 일종의 ‘기술 적응형’ 작업을 지속해온 작가는 동시대
미디어를 민첩하게 수용하고 변용한다. 포스트 인터넷 아트, 무빙
이미지, 디지털 미디어 등 광범위한 키워드가 얽혀 있는 김희천의 스크린은 영원토록 갈무리되지 못할 디지털
시대의 그늘을 비춘다.
기술, 사회, 인식
김희천의 작업이 재생될 때, 사회를 읽어내기 위해 ‘합의된 조건과 양식은 안갯속으로
사라지곤 한다. 실제 촬영 영상과 파운드 푸티지가 동시에 조작되는 그의 비디오에서 디지털 영역은 물리적
세상과 융합하면서도 충돌한다. 이는 런던 헤이워드 갤러리 HENI 프로젝트
스페이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김희천의 영국 첫 번째 개인전 에서도 마찬가지다. 가상에 도사리는 무언가가
실제 세계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GPS,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 기술적 실험으로써 심도 있게 탐구해온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두 점의 작품 〈탱크(Deep in the
Forking Tanks)〉(2019), 〈Double
Poser〉 (2023)를 선보인다. 전자는
지난2019년 아트선재센터에서 첫선을 보인 작품이며, 후자는
커미션 작업이자 국립현대미술관 〈게임사회〉 전에 출품한 〈커터 3〉(2023)를
업데이트한 버전이다. 전시와 동명의 신작 제목은 ‘특정 하위문화에 관해 잘난 체하지만 사실 그에 대해
무지한 이’를 칭하는 영어 속어로, 비디오 게임 미학과 스케이트보드 문화 등이 중첩되어 펼쳐지는 영상의
실마리가 된다. 그렇게 4년의 시간차를 넘어 같은 공간에
병치된 〈탱크〉와 〈Double Poser〉는 현실과 가상간 경계를 흐리는 동시에 그 존재를 수면으로
끌어올린다.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
여기 통제권을 전적으로 양도한 채 현실을 부유하면서도 가상세계 내부에서 기이한 감각을 체현하는 인물이 있다. 는 전화벨이 울림과 동시에 주인공이 침대에서 깨어나는 각성 장면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는 누군가로부터 “임무 대기하라, “의심받지 말라”는 지시와 두더지답게
행동하라, 즉 스파이로서 활동하라는 구체적인 명령을 받는다. 곧이어
작품은 비디오 게임의 형태를 취한다. 주인공이 방에서
나온 뒤 영상 배경은 작품이 실제로 전시되고 있는 런던 사우스뱅크 센터로 전환된다. 브루탈리즘 양식으로 1967년 완공된 사우스뱅크 센터는 헤이워드 갤러리가 기반을 두고 있는 건물이다. 이곳에 위치한 언더크로프트(undercroft)는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스케이트보드 문화의 메카였던 장소로, 김희천의 신작에서 3D 렌더링으로 면밀하게 재현된다.
단편적으로
이는 거울상이지만, 테크놀로지를 통해 매개되고, 테크놀로지가
가능케 하며, 테크놀로지만을 통해 볼 수 있는 테크노스케이프(technoscape)이기도
하다. 게임 엔진 유니티(Unity)를 통해 구축된 영상은 3인칭 스케이트보드 비디오 게임의 인터페이스,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시계, 주인공의 아바타, 투명하게 떠다니는 한 쌍의 파란색
손으로 채워진다. 주인공이 스케이트보드 위에서 사우스뱅크 센터 곳곳을 누빌 때 손은 그의 행동과 동기화되고, 화면 맞은편 관객의 동작역시 작품 내 동작감지센서로 인해 스크린에 일정 부분 투영된다.
한편, 관람객의 시선은 통제권자, 제3자
더 나아가 주인공 본인의 것을 넘나든다. 우리는 게임 플레이어의 입장이 되었다가도, 프로게이머의 스트리밍을 멍하니 응시하는 시청자가 된다. 매너리즘에
빠진 스케이터가 종종 지루함을 이기지 못하고 휴대전화를 꺼내 가상세계로 향할 때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한다. 이번에는 빠른 속도로 날다가 유리창에 충돌해 죽은 듯한 새들의 이미지를 보자.
이들은 이상과 가상을 구분하지 못한 나머지 스크린을 매개로 혼란에 빠지고 만 인간과 다를 바 없다.
이처럼 여러 이름으로 호명되는 관객은 각기 다른 주체성 간 긴장 상태를 마주한다. 작품에
내재하는 다중 시선은 자연스럽게 선형적 구조의 가능성을 무너뜨리고, 관람자는 작가가 동원한 시청각 정보
속에서 완결도 한계도 없는 임무 지시문을 받아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