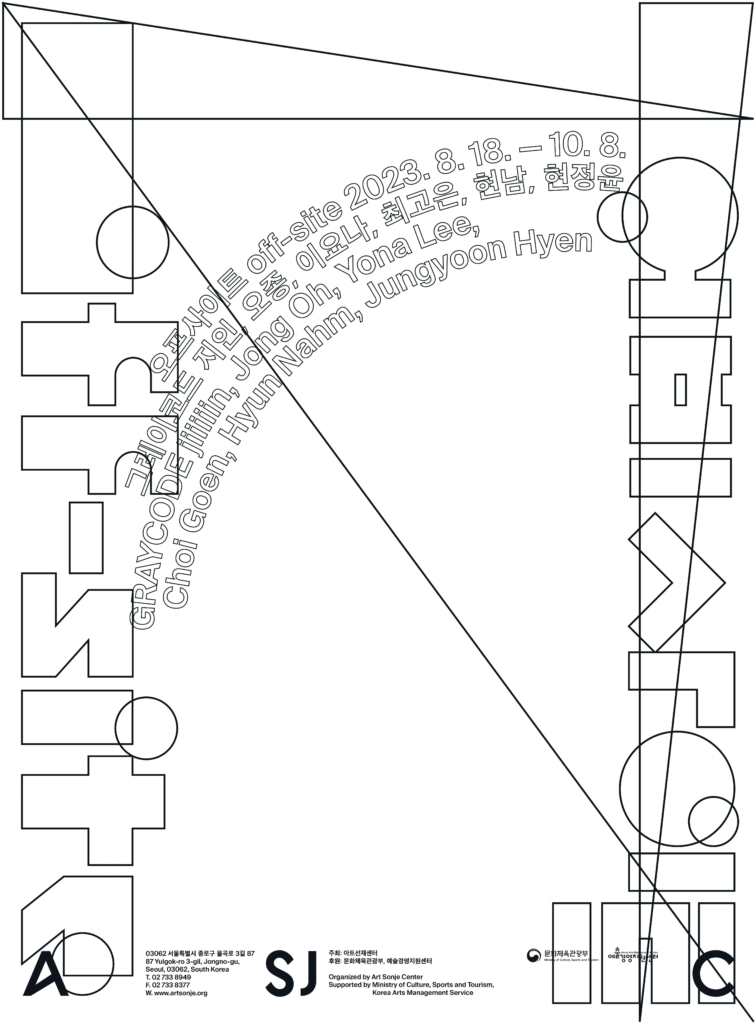현정윤의 초기 작업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대상의 존재와 공간 사이에 누락된
애착 관계의 틈을 공간적 규율과 질서를 중심으로 변화되고 파생된 생각들로 구축해 나갔다. 그는 존재감을
발산하는 대상의 주변을 ‘점유하는 상태’ 자체에 주목하면서, 〈안짱다리의 역사〉(2014)를 기점으로 애착 관계를 기형적인 신체로 옮겨간다. 시멘트로
캐스팅한 네 점의 수직적 형태는 후천적으로 안짱다리가 진행되는 과정을 신체와 미리 쓰여진 규칙의 도시 공간을 상상하며 만들었던 신체 조각으로 사물과
신체의 관계성에 대해 상상하도록 한다. 점점 넓어지는 안짱다리 사이의 공간을 캐스팅된 하나의 실루엣
덩어리의 조각은 스스로가 독립적인 화자가 되지만, 작가는 그 이후에 다양한 설치 작업들을 진행하면서
전시 Walking on tiptoes (2018, 주영한국문화원, 런던)부터 조각 전후의 주변 상황을 관조하는 연극적인 형태의 조각적 서사를 설정하기 시작한다. 예컨대, 까치발을 들고 걷는다는 신체적 행동(〈I see you from here〉, 2018)으로 인해 발현되는 모양새가 우리가 걷게 될 바닥이 그리 견고하지 않을 것을 상상하게 되는 공간과
신체의 관계를 대변하는 것이 일례이다. 작가가 구현하는 조각에 대한 상황 설정은 조각을 화자로 자립시키면서
존재의 유무를 가늠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성을 구체적으로 가시화하지 않고, 주변부의
부산물(〈These will be the days〉, 2018)과 흔적에 주목한다. 여기에 따라오는 주변부라는 시간의
감각은 대상을 둘러싼 비가시적인 상황을 작가 특유의 유쾌하고 ‘웃-픈’ 시나리오로 구성해 조각적 형태로
다소 고집스럽게 등장하기 시작한다. 여기서 신체를 공간 밖의 또 다른 신체, 혹은 동세의 구현 방식으로부터 그 존재를 분리시키는 작가의 도전에 경계를 흐리는 전략적 장치를 개입시킴으로써, 사물과 미묘하게 포개어지는 새로운 동세와 상황으로 존재의 정당성을 보장하고 있다.
신체의 일부를 떼어낸 듯한 조각은 재스모나이트와 실리콘, 석고 등에 스킨 색의
안료를 조색해 살덩이를 연상케 한다. 현정윤에게 조색과 도색의 개념은 신체의 일부를 표현하기 위한 물성
외에 강제로 변형시킨 스테인레스 파이프 위에 회화적인 방식으로 표면을 도장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한다. 작가가
〈Mama never told me how my dreams will be shattered〉(2017)부터 〈On my knees〉(2019)까지 매끈하게 도색을 했다면, 근래에 〈운동화 끈〉(2021)에서 회화적 명암 처리가 두드러져 조각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한다. 이와
더불어, 2019년까지 탈구된 신체 연작(〈On my way〉 1, 2, 2019)은 기형적인 신체 조각이 주체적인
존재였다면, 점차 대상에 제갈을 물리듯이 이질적인 물리적 장치를 개입시키므로 주체성을 시각적으로 무력화
한다. 각각의 조각은 공간을 점유하고 있으나 속박의 형태로 제갈을 물린 방식은 조각 자체에 탑재되어
있어 스스로가 자유롭지 않은 조각을 보여준다. 대개, 등장하는
조각적 덩어리와 그것을 감싸고 통제하는 틀을 자물쇠와 체인, 라텍스 등 선적인 형태의 도구로서 사용하여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미묘한 긴장관계는 주체와 객체,
질료와 형태 사이의 비생산적인 변증법을 페티쉬적으로 묘사한다. 이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장치를 통해 대상을 의식적으로 통제하고 속박하려는 현정윤의 조각에 대한 가학적인 태도는, 그로 인해 변형되는 물성의 아슬아슬한 팽창과 압축의 순간을 포착하는데 있다.
어떤 순간적인 모양새를 만들기 위해 사실상 굉장히 고단한 직조의 과정이 긴 시간 축적되는데 조각적 실천에 대한 가학적인 수행으로 쾌감이
동반된다. 유사 반복의 제작 과정에서 현정윤이 고집하는 몸짓들은 두려움, 불안, 모면, 회피, 그리고 혐오 등과 같은 자신을 관철하는 태도로 귀결된다. 그러므로
그의 손은 손끝으로 그 대상을 건드려가며 원하는 방향과 원하지 않는 양쪽 방향을 오가면서 형태의 윤곽을 따라가고,
물성의 중량감을 헤아리며, 덩어리의 구조를 숙고하여 제 역할을 파악해 나가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