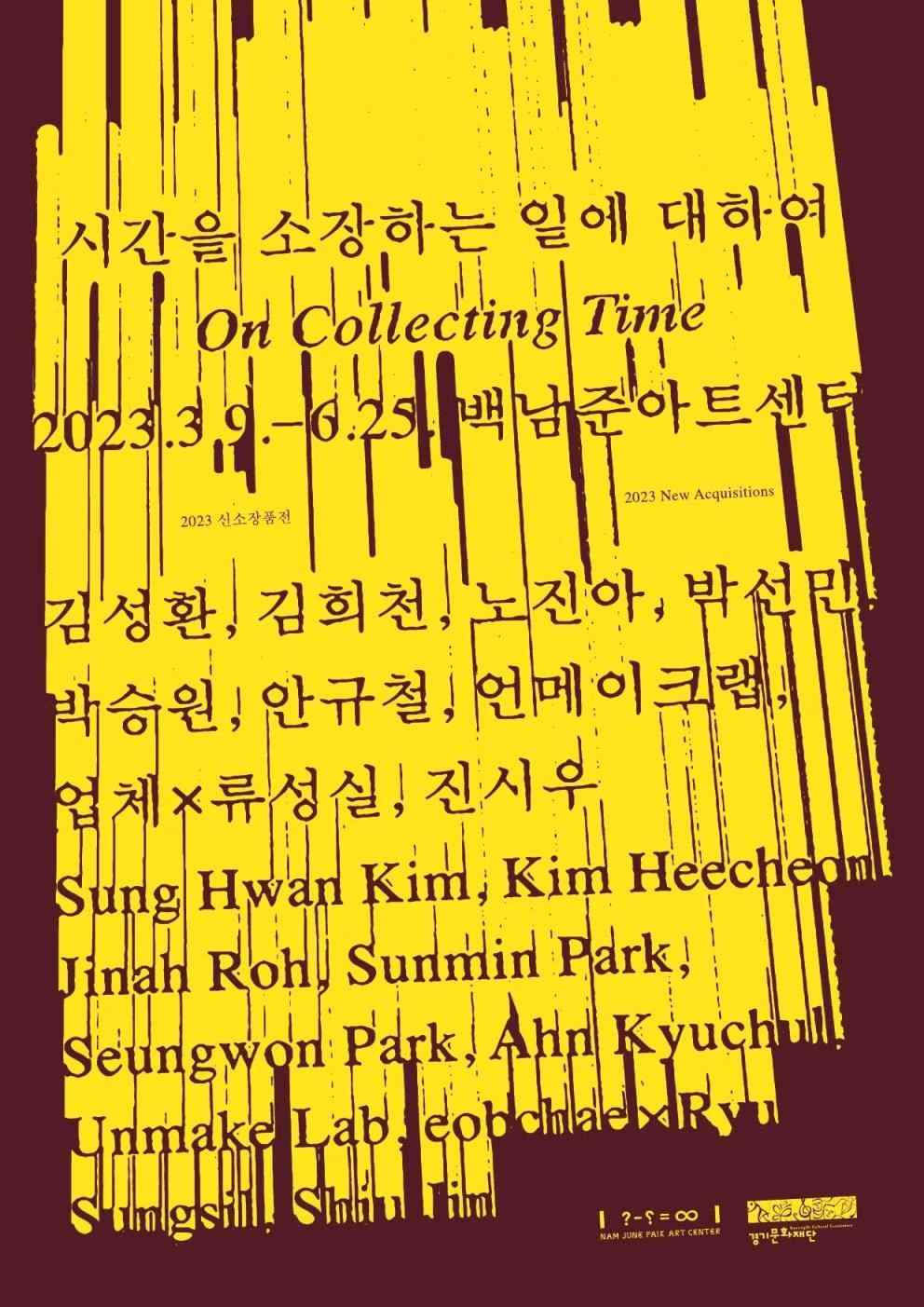두
번째 영상 〈아다다〉는 형제 혹은 친구로 보이는 같은 나이대의 두 남성 퍼포머를 등장시켜 아버지와 아들을 연기하게 하고, 아들의 시점에서 술 취한 모습으로 ‘벗겨’라는 식으로 아들에게 명령하는,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를 내레이션으로 담아내며 진행되는데, 그러한 일상 공간을 벗어나면 두 사람이 마치 동등한
입장에서 일종의 작업 공간 같은 곳에서 맡겨진 과제를 수행하기도 한다. 이는 정체성을 주어진 역할로
환원시키며 그 사이(단순한 퍼포머라는 존재)에서 의도를 읽게끔
하는 지점이다. 외국인이 한국인의 언어를 전유해 어색하게 분절되며 정상적 언어에서 미끄러지는 언어는, ‘아다다’라는 말더듬이의 함의에서 읽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마치 파악할 수는 없지만 작가의 유년기의 기억,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외국에서의 경험과 연관을 맺는 것은
아닐까 추정하게도 하지만, 우선은 체화된 언어가 아닌 대본·대사로서의 언어임을 그 자체로 드러내는 일종의
흉내 내기의 언어를 이 두 배우가 연기하기와 함께 드러내고 있다는 데서 오는 이국의 경계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새겨지는 체험이다.
그러니까 한국사람 혹은 아시아인으로 보이는(실제로는 아시아계 외국인) 이 두 배우가 낯설게 표현되는 지점이 결정적으로 언어라는 점으로부터 그 외양으로부터 오는 환상이 깨지고 있다. 그것은 신체 내재적인 목소리인 것처럼 우리 스스로에게 전이되어 드러난다. 이러한
균열되는 목소리로부터의 균열되는 신체를 우리에게 옮기고자 한 것이 이 비디오의 어떤 결정적 의도로 보인다. ‘아버지’를
부르며, 회상하며 바닷가를 보는 아들의 시선을 드러내는 클로즈업된 그의 (말 없는) 등은 말없이, 사라진다.
아버지를 부르며 아버지 없는 어느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그 자체로
아들보다 아버지를 체현하는 이 장면은 내레이션의 겹침과 텅 빈 신체와 한편으로 바다 소리 속에서 구현된다. 바다에서
뛰노는 많은 이들과 함께 펼쳐진 바다로 급격하게 카메라 시점이 이동한 후 조상현의 ‘심청가의 눈’이 병치되는데,
정서적 충격을 주는 부분이다. 마치 엔딩 크레디트의 올라가는 자막 언어들과 같이 그 말은
표면에서 뚜렷하게 자리를 남기며 사라져 간다. (이는 앞서 일종의 해설로서의 메타 전시의 영역을 전시에
포함시키며 온전히 전시만의 문맥을 구축하는 것과 같이, 형식 자체를 형식을 가진 내용으로 만드는 작가의
역량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
두 개의 영상은 검은 카펫 (또는 경계)에서 보게 되어 있는데, 검은 카펫은 단지 바닥이 아닌 평면의 공간으로, 전시의 맥락으로
편입하게 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것에 앉을 때도, 곧
일종의 보는 것으로서의 네모난 프레임, 그리고 공간의 바닥으로의 누임-설치에
신체를 포갤 때 불편함을 느끼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편하게 전시에 포개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으며, 앞서 전시장을 들어올 때처럼 패널은 하나의 선분으로부터 나뉜 것으로 패널들이 짜여 있어 안과 밖이 분리되지
않고 단지 구분되고 나아가 들어간 것인지 나오는 것인지 하는 혼란을 안기게 된다.
특히 이는 왼쪽의
〈마나하타스 댄스〉를 볼 때 해당되며, 영상이 〈아다다〉보다
작게 설치되어 있고, 공간도 그에 맞게 더 작게 구획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공간을 나오면서 (회화, 설치, 건축으로서의) 네모난 검은 프레임이 있고 이 역시 밟지 않고 〈아다다〉
다음 공간으로 갈 수 없고 그 옆에 파란색 구조물이 약간 중첩되어 있으며, 옆면이 나무 프레임과 같은
색이라 그 높이(가 있음)를 가늠하지 못하고 잘못하면 발에
채이게 된다. 중간 중간 위에서 내려온 조명(따로 전시장
안에 원래 있던 조명은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설치 안에서만 쓴 조명으로만 전시를 구성했다)이나 서 있으면서 빛을 내는 어떤 시선-신체로서의 구조물, 허공에 떠 있는 나무 막대기 등이 온전한 평면성을 거역하며 시선을 분산되게끔 만든다.
온전히
영상, 회화, 설치로 수렴되지 않은 체험 이후에, 3층에는 2층의 구멍/문/경계로서의 입구 대신 들어가기를 일차적으로 저지하고 또 주저하게끔 하는 어둠의 패널-경계를 마주하고 그 좁은 경계를 타고 들어가면 영상을 보는 자리, 건축적
풍광을 확인하게 된다. 곧 입구의 불투명한 프레임과 대구를 이루며, 보는
게 아니라 볼 수 있는 시점의 시작으로 시선을, 몸을 위치하게 한다.
그리고 여전히 막힘의 시작은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영상의 막으로, 아직 열리지 않은
상태다. 이제 영상이 전하는 소리만을 등 뒤로 하며, 오히려
그 스크린으로부터 멀어지며, 그 와중에 검은 스크린으로서의 카펫을 밟으며 꽤 먼 거리를 걸어(거의 전시장 입구에서 전시장 끝으로 간 셈이니, 이층의 공간 경험에
비해서도 지나친 확장의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좁은 객석에 위치하고, 또는 그 앞 검은 카펫에 앉게 되고, 〈템퍼 클레이〉를 보게 된다.
작가는 자신의 (분절되고 파편적인 서사의 궤적을 이루는) 영상에서 단지 어떤 ‘템퍼 클레이’라는 단어들로만 기억될 수 있음을 관객의 체험의 일부로 설명했는데, 곧 작가의 생각은 내용과 형식의 분리된 쌍, 또 메시지나 내용을
담는 형식, 곧 얼마나 작가의 생각이 잘 전달되었는가, 그것을
결과적으로 얼마나 잘 표현했는가라는 의문을 자신에게, 또 작가에게 되묻는, 소통을 일종의 하나의 코드 아래 매체적 한 형식으로써 동일한 내용이 주고받을 수 있음의, 소통 이론과는 차이가 있다. 가령,
작가에게 있어 여기서 ‘템퍼 클레이’는 하나의 기표 그 자체로, 그것이 기억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