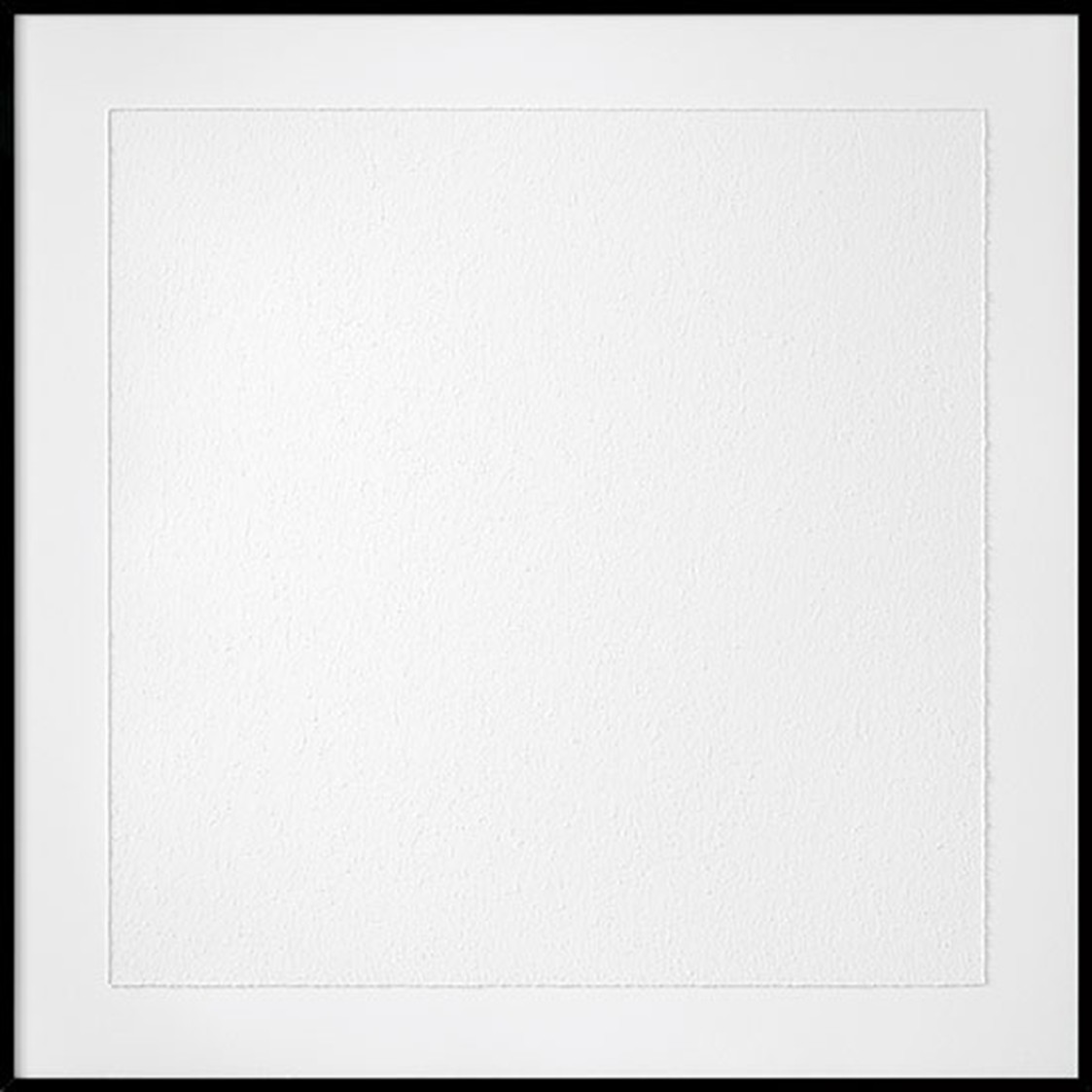Articles
[칼럼] 아무것도 없는 캔버스, 작가가 의도한 건?
2018.12.19
조숙현 | 전시기획자

이명호,〈Tree... #9〉, 2017 © 이명호
잿빛
하늘 아래 갯벌이 펼쳐져 있다. 배경은 억새밭이다. 갈색과
초록이 듬성듬성 섞여있는 억새밭에 문득, 하얀 캔버스가 꿈처럼 서 있다. 이 캔버스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 뒤에는 나무 한 그루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답이 될 수 없다. 캔버스 뒤에는 사람이 서 있을
수도 있고,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으며, 갈대밭의 한 조각이
될 수도 있다.
이명호
작가는 ‘Tree…’(2006/print in 2007) 시리즈로 데뷔와 함께 엄청난 주목을 받아온
사진작가이다. 피사체에 따라 제목을 붙이는 그의 원칙에 따라 작업에는
나무들이 등장한다. 벌판 위에 예의 흰 캔버스가 우뚝 서 있다. 캔버스
안에 나무가 존재한다. 이때 ‘tree’(나무)는 자연물이 아닌 사진이나 회화 등의 예술작품으로 환기된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나무는 프린트나 회화(오브제)가 아니고 벌판에
뿌리내리고 있는 실제의 나무이다.
작가는
나무 뒤에 대형 천을 설치하는 트릭을 통해 사진과 현실을 교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사진과 재현’이라는 매우 원초적인 사진 담론을 생산했다. 관객들은 그의 사진을
관찰하다가 어느 순간 ‘어...’ 하며 당혹감을 갖게 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를 유명하게 만든 것은 이런 담론보다는 시적이고 은유적인 이미지와 감수성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사진은 꿈같은 현실이며, 현실이 될 수 없는 한 폭의 아름다운
꿈이다.
이번
개인전 《어떤 것도 아닌, 그러나 Nothing, But》은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피사체와 테마로 구분하자면 나무/신기루(사막)/nothing,
but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작가가 예술의 본질을 환기하는 방식, 즉 예술의 역할을 작가 임의의 법칙에 의해 세 가지로 나눈 것이다. 그것은
다시 현실을 드러내는 것 / 비현실을 만드는 것 / 앞의
두 가지를 포함하고 그 너머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다.
시리즈는
현실을 드러내는 작업이다. 현실의 나무를 드러내고 돋보이게 하는 방식은 결국 사진 예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역할에 충실한 것이다. 반면 ‘Mirage’ 시리즈는
사진을 통해 비현실을 창조한다. 막막한 사막에 설치된 길고 긴 광목천을 원경에서 촬영하면, 흰 천이 마치 오아시스나 바다처럼 보인다. 작가가 생각하는 예술의
두 번째 기능인, ‘또 다른 현실(신기루)’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Nothing, But’ 시리즈는 현실과 비현실 너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특히 두 시리즈 이후의 예술을 대하는 작가의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혹스러울
정도로 하얀 캔버스가 버젓이 관객을 마주한다. 아무것도 없지만(nothing),
사실은 작가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미지를 계속해서 촬영한 결과물이다.(과다노출에 의해
이미지는 사라지게 된다) 이미지를 채집하고 포착하려는 작가의 욕망이 쌓이고 나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망함과 멍멍함이 표현되었다.
반면
대상들을 지우고 나니 더 많은 것들이 보이는 현상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느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게 된다. 관객의 입장에서는 nothing이지만 작가의 입장에서는 anything이 될 수 있는, 현실과 비현실이 혼합되어 있는 작업이다.
그러나
이런 담론과 사유 보다 이명호의 작업이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큰 이유는 그가 ‘미지의 세계’를 염두에 두기 때문이다. 그의 사진을 곰곰이 바라보고 있노라면 새로운
세계로의 가능성을 생각해보게 된다. 고요한 해변과 갯벌에 그림처럼 놓인 캔버스의 뒤에는 무엇이 존재할까? 저 문을 열면 다른 우주가 펼쳐지지는 않을까? 작가가 열어 놓은
저 미지의 세계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기를, 캔버스 뒤에 있는 미지의 세계가 성큼성큼 걸어와 주기를, 나는 언제나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