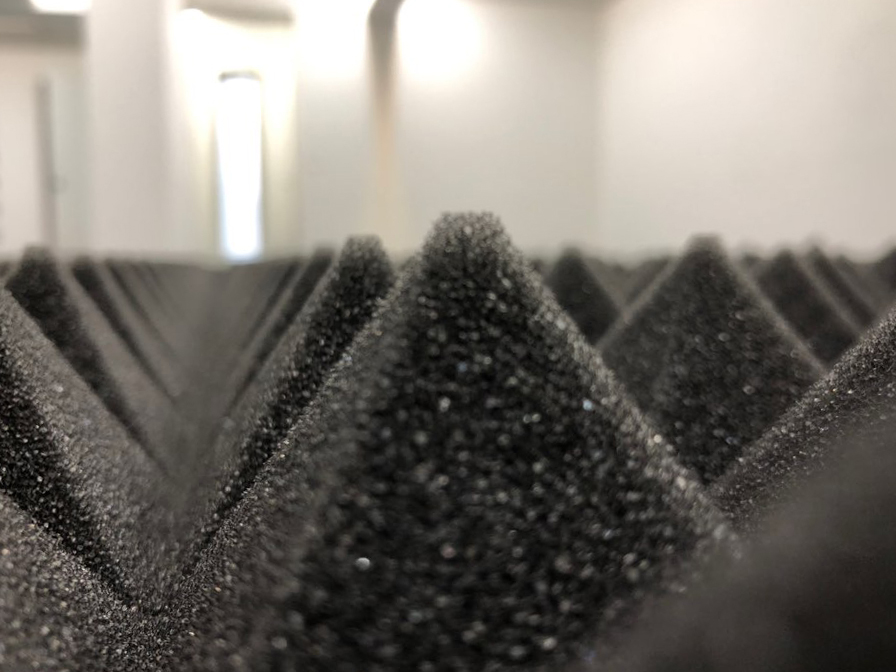개인전 (요약)
박기원은 313 아트프로젝트 (2019, 2016),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10), 마드리드 Museo Nacional Centro de Arte
Reina Sofia (2006), 아르코미술관 (2006) 등 국내외 유수 기관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그룹전 (요약)
박기원은 그룹전으로는 수원시립미술관 아트 스페이스 광교 (2020), 청주시립미술관 (2019), OCI 미술관 (2018),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16), 아모레퍼시픽미술관 (2016), 서울 금호미술관 (2015), 서울 Esprit Dior, DDP (2015), 프랑스
물랭 Galleria Continua (2014-15), 베를린
East Side Gallery (2014), 부산시립미술관 (2013) 전시에 참여했다. 2005년에는 제51회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전시의 참여 작가로
선정된 바 있으며, 2000년에는 광주 비엔날레 특별 전시에 참여하였다.
수상 (선정)
박기원은 2010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올해의 작가로 선정되었다. 2022년에는 제 36회 김세중조각상을 수상했다.
작품소장 (선정)
박기원의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아모레퍼시픽 미술관, 아르코 미술관, 루이비통 파운데이션(파리), 청주시립미술관, 대구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